탄도 둘레길은 북동쪽 해안을 따라 목재 데크길이 길게 이어진다. 밀물 때면 데크 밑 기둥까지 물이 들어와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다. 반대로 물이 빠지면 갯벌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이처럼 탄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다. 거기다 안개산 주변으로 짧지만 재미난 숲길도 여럿 있다. 특히, 대숲 터널길은 아이들에게 어드벤처 공간이다. 탄도에는 자동차가 단 한대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없이 안전한 섬이다.

전남 무안 탄도는 빼어난 절경이 없는 평범한 섬이다. 하지만 탄도는 아주 특별한 섬이기도 하다. 29가구 50여 명이 살아가지만 섬에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없다. 요즘 육지의 어느 오지마을을 가도 자동차 없는 마을은 없다. 한두 가구가 사는 작은 섬에도 자동차가 있다. 사람 이동용이 아니더라도 화물 운반용으로라도 꼭 자동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탄도에는 자동차가 없다. 넋 놓고 생각에 잠겨 걸어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길가에 나와 마음껏 뛰어놀아도 안전한 섬. 잠깐이라도 자동차 없는 세상에 살아보고 싶다면 탄도로 가라! 탄도야말로 느린 삶이 가능한 진짜 슬로시티다!
높은 산이 없는 탄도는 해안가를 지나 숲길로 이어지는 둘레길도 걷기에 더없이 편하다. 숲길 한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만든 대숲 터널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탄도(炭島)는 한자의 뜻처럼 숯이 많이 나서 탄도라 했다 한다. 옛날에 섬에 소나무가 많아 숯을 구워 팔았기에 탄도란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적 0.502㎢, 해안선 5㎞에 불과한 작은 섬에 나무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는가? 주민들의 땔감을 하기도 부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숯을 구워 팔 수 있었을까.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함부로 벨 수도 없었다. 국가에서 금송령으로 보호한 소나무로 숯을 굽다니 어불성설이다. 본래 탄도는 여울도였다. 여울이란 하천이나 바다가 급경사를 이루거나 폭이 좁고 얕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한다. 여울의 물은 소리 내어 흐른다. 탄도 앞바다는 갯벌이 드넓다. 썰물 때면 물이 빠지면서 이 갯벌에 급하게 흐르는 물길이 생기는데 이것이 여울이다. 그래서 여울 섬이었다. 여울의 한자어는 탄(灘)이다. 하지만 여울 섬이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여울 탄이 아니라 숯 탄(炭)으로 잘못 기재됐던 것이다. 여울 섬이 숯 섬으로 와전된 것이다.
탄도로 가는 여객선 선착장은 무안군 망운면 조금나루다. 조금나루는 송학포구라고도 불렸었다. 조선시대에는 무안지방의 세곡을 모아서 영광의 목관으로 운송하는 주요 포구이기도 했다. 조금나루란 어떤 뜻일까? 바다는 달의 지배를 받는다. 달의 인력에 따라 바닷물은 차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섬사람들도 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의 들고 남에 따라 섬사람들의 생활이 좌우된다. 섬과 바다를 지배하는 달의 하수인은 물때다. 조금이란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작은 시기다. 매달 음력 초여드레와 스무사흘 전후의 3~4일이 조금에 해당한다. 조금나루를 설명하는 간판에는 “조금나루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조금에도 나룻배를 탈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쓰여 있다. 생태지평, 무안군,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등의 명의로 세워진 간판이다. 하지만 이 간판의 설명은 오류다. 탄도 이장님이 이름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신다.
갯벌 바다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작고 늘 물이 들어와 있는 조금에는 당연히 나룻배를 탈 수 있다. 조금에 나룻배를 타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조금나루라 했을까? 탄도와 망운반도 사이 갯벌에는 썰물 때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다른 섬들처럼 돌을 놓아서 만든 징검다리인 노둣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길이다. 탄도 갯벌은 푹푹 빠지는 펄 갯벌이 아니라 모래가 섞인 혼합 갯벌이다. 더구나 이 길은 발이 빠지지 않는 자갈길이다. 그래서 걸어 건널 수 있었다. 이 갯벌의 길을 탄도 사람들은 열개라 불렀다.사리 때 갯벌에 물이 쫙 빠지고 열개가 생기면 갯고랑의 여울물도 무릎까지밖에 안 잠길 정도로 얕아진다. 그때 탄도 사람들은 이 열개 길을 걸어서 뭍으로 건너다녔다. 그래서 사리 때는 달리 나룻배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는 조금 때면 이 길은 다닐 수 없었다. 뭍으로 갈 방법은 오직 배밖에 없었다. 그래서 탄도 사람들은 사리 때는 열개를 걸어서 건너니 나룻배를 타지 않았다. 반면 조금 때는 나룻배를 타고 다녀야 했다. 조금 때 이용하던 나루, 조금나루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때문이다. ‘조금에도 배를 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때만’ 이용하던 나루라 해서 조금나루가 된 것이다.
탄도의 광활한 갯벌은 감동적이다. 매립과 간척으로 갯벌이 사라져가는 시대, 탄도 갯벌은 그 자체로 귀한 보물이다. 탄도 갯벌에서는 날마다 모세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난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쯤은 기적 축에도 끼지 못한다. 날마다 바다가 통째로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하는 갯벌. 기적이 일상인 섬. 탄도에는 집앞에뻘, 뒤뻘, 머시리뻘, 밥뻘, 작은뻘, 숭치뻘 등이 있는데 이 뻘에서 낙지와 감태, 석화, 농게 등이 난다. 탄도 갯벌은 1960년대까지 김장용 굴의 주산지였다. 수하식 굴양식이 보급되면서 탄도 갯벌의 토종 굴은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굴은 여전히 낙지, 감태와 함께 탄도 주민들의 주 소득원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탄도 갯벌은 감태로 명성이 드높았다. 탄도 감태가 유명한 것은 갯벌이 기름져서다. 특히 탄도 갯벌의 찰감태는 무안 장에서도 최고로 쳤다. 탄도 갯벌에는 두 종류의 감태가 자라는데 하나는 찰감태, 또 하나는 그냥 감태다. 흔히 감태는 매생이보다 식감이 거칠지만 찰감태는 매생이처럼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 일반 감태는 곧게 뻗어서 자란다 해서 뻐드래기라고도 한다. 식감도 약간 뻣뻣하다. 반면에 찰감태는 약간 꼬불꼬불하게 자라면서 봄이 되면 잎이 파래처럼 넓어진다. 하지만 부드러운 맛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탄도 사람들은 찰감태를 선호한다. “뻐드래기가 보리밥이라면 찰감태는 쌀밥”이라고 한다. 비단처럼 부드럽다고도 한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나오는 찰감태를 최상품으로 친다. 이때 나오는 감태가 새순이라 더 부드럽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감태를 기계로 세척하지만 탄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찬물에 손을 담가 뻘물을 빼낸다. 기계로 씻으면 감태 고유의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탄도 감태 무침은 그 짙은 바다 향이 살아 있다.
작은 섬이지만 탄도는 땅이 비옥하고 농작물이 실하다. 탄도에서 생산되는 마늘이나 양파는 그 씨알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크다. 무슨 특별한 토양도 아니고 옥토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땅에서 어찌 그런 수확이 가능할까. 탄도 이장님은 “큰 배가 다니기 어려워 비료 같은 것도 뭍에서 들여오기가 쉽지 않아 비료도 많이 못 주는데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땅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추정할 뿐이다. 비료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말에 순간 딱 드는 생각. 바로 그게 아닐까.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것이 작물을 잘되게 한 원인이 아닐까.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 토양이 황폐해진다. 그런데 비료를 잘 안 쓰니 퇴비를 많이 썼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땅을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 농작물을 잘되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탄도는 생김새가 용 모양이라 한다. 그래서 탄도에는 용과 관련한 지명도 여럿이다. 용머리 해안도 있고 용샘이란 이름의 둠벙도 있다. 용머리 해안 앞에는 여의주도 있다. 용머리 앞 동그랗게 보이는 작은 무인도의 이름이 야광주도(夜光珠島)다. 탄도와 야광주도 사이에도 물이 빠지면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이 길을 닻줄이라 부른다. 야광주란 암흑 속에서도 빛을 낸다는 기석이다. 밤에도 빛나는 구슬. 야광주도는 그래서 여의주가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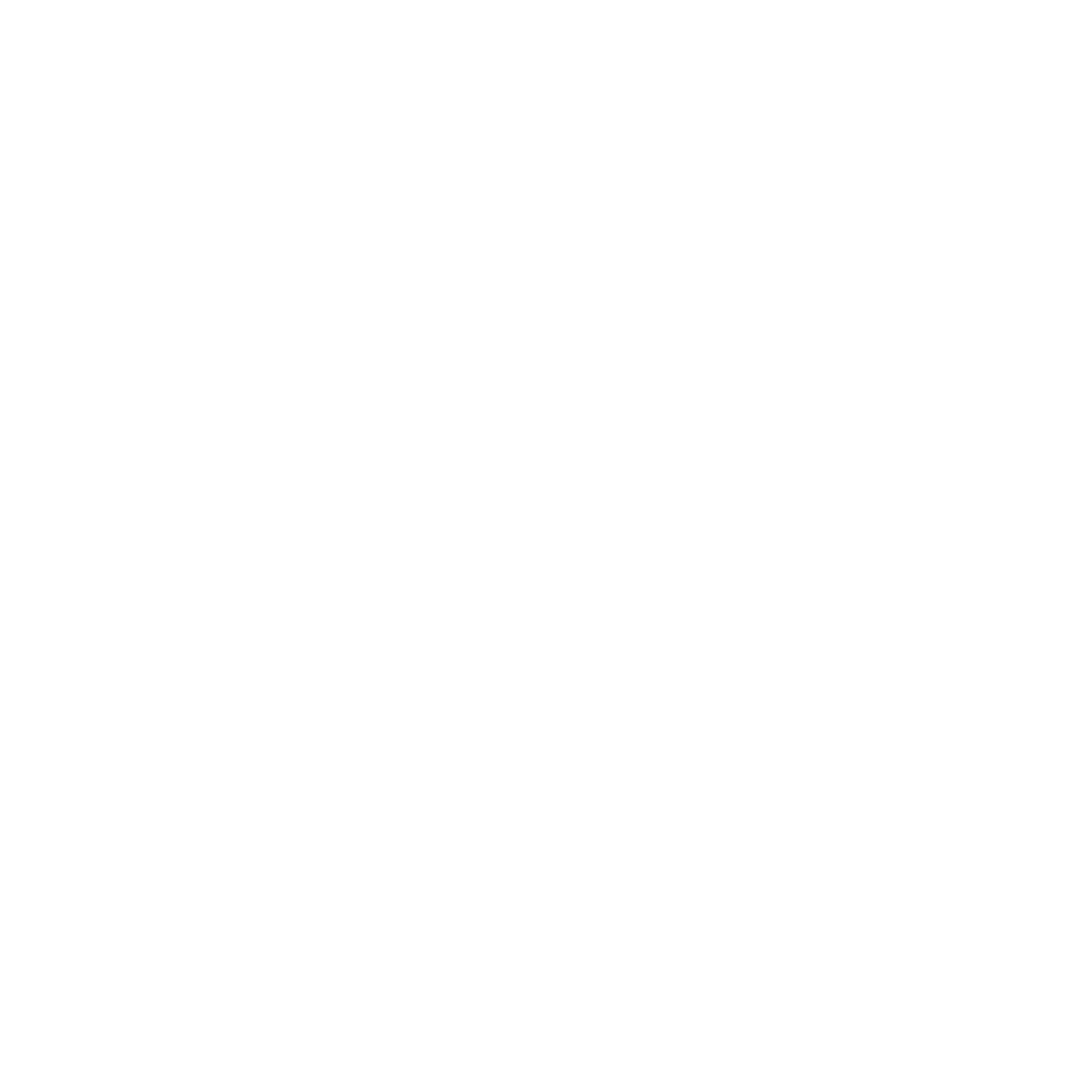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탄도 둘레길은 북동쪽 해안을 따라 목재 데크길이 길게 이어진다. 밀물 때면 데크 밑 기둥까지 물이 들어와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다. 반대로 물이 빠지면 갯벌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이처럼 탄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다. 거기다 안개산 주변으로 짧지만 재미난 숲길도 여럿 있다. 특히, 대숲 터널길은 아이들에게 어드벤처 공간이다. 탄도에는 자동차가 단 한대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없이 안전한 섬이다.
전남 무안 탄도는 빼어난 절경이 없는 평범한 섬이다. 하지만 탄도는 아주 특별한 섬이기도 하다. 29가구 50여 명이 살아가지만 섬에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없다. 요즘 육지의 어느 오지마을을 가도 자동차 없는 마을은 없다. 한두 가구가 사는 작은 섬에도 자동차가 있다. 사람 이동용이 아니더라도 화물 운반용으로라도 꼭 자동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탄도에는 자동차가 없다. 넋 놓고 생각에 잠겨 걸어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길가에 나와 마음껏 뛰어놀아도 안전한 섬. 잠깐이라도 자동차 없는 세상에 살아보고 싶다면 탄도로 가라! 탄도야말로 느린 삶이 가능한 진짜 슬로시티다!
높은 산이 없는 탄도는 해안가를 지나 숲길로 이어지는 둘레길도 걷기에 더없이 편하다. 숲길 한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만든 대숲 터널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탄도(炭島)는 한자의 뜻처럼 숯이 많이 나서 탄도라 했다 한다. 옛날에 섬에 소나무가 많아 숯을 구워 팔았기에 탄도란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적 0.502㎢, 해안선 5㎞에 불과한 작은 섬에 나무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는가? 주민들의 땔감을 하기도 부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숯을 구워 팔 수 있었을까.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함부로 벨 수도 없었다. 국가에서 금송령으로 보호한 소나무로 숯을 굽다니 어불성설이다. 본래 탄도는 여울도였다. 여울이란 하천이나 바다가 급경사를 이루거나 폭이 좁고 얕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한다. 여울의 물은 소리 내어 흐른다. 탄도 앞바다는 갯벌이 드넓다. 썰물 때면 물이 빠지면서 이 갯벌에 급하게 흐르는 물길이 생기는데 이것이 여울이다. 그래서 여울 섬이었다. 여울의 한자어는 탄(灘)이다. 하지만 여울 섬이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여울 탄이 아니라 숯 탄(炭)으로 잘못 기재됐던 것이다. 여울 섬이 숯 섬으로 와전된 것이다.
탄도로 가는 여객선 선착장은 무안군 망운면 조금나루다. 조금나루는 송학포구라고도 불렸었다. 조선시대에는 무안지방의 세곡을 모아서 영광의 목관으로 운송하는 주요 포구이기도 했다. 조금나루란 어떤 뜻일까? 바다는 달의 지배를 받는다. 달의 인력에 따라 바닷물은 차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섬사람들도 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의 들고 남에 따라 섬사람들의 생활이 좌우된다. 섬과 바다를 지배하는 달의 하수인은 물때다. 조금이란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작은 시기다. 매달 음력 초여드레와 스무사흘 전후의 3~4일이 조금에 해당한다. 조금나루를 설명하는 간판에는 “조금나루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조금에도 나룻배를 탈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쓰여 있다. 생태지평, 무안군,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등의 명의로 세워진 간판이다. 하지만 이 간판의 설명은 오류다. 탄도 이장님이 이름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신다.
갯벌 바다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작고 늘 물이 들어와 있는 조금에는 당연히 나룻배를 탈 수 있다. 조금에 나룻배를 타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조금나루라 했을까? 탄도와 망운반도 사이 갯벌에는 썰물 때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다른 섬들처럼 돌을 놓아서 만든 징검다리인 노둣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길이다. 탄도 갯벌은 푹푹 빠지는 펄 갯벌이 아니라 모래가 섞인 혼합 갯벌이다. 더구나 이 길은 발이 빠지지 않는 자갈길이다. 그래서 걸어 건널 수 있었다. 이 갯벌의 길을 탄도 사람들은 열개라 불렀다.사리 때 갯벌에 물이 쫙 빠지고 열개가 생기면 갯고랑의 여울물도 무릎까지밖에 안 잠길 정도로 얕아진다. 그때 탄도 사람들은 이 열개 길을 걸어서 뭍으로 건너다녔다. 그래서 사리 때는 달리 나룻배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는 조금 때면 이 길은 다닐 수 없었다. 뭍으로 갈 방법은 오직 배밖에 없었다. 그래서 탄도 사람들은 사리 때는 열개를 걸어서 건너니 나룻배를 타지 않았다. 반면 조금 때는 나룻배를 타고 다녀야 했다. 조금 때 이용하던 나루, 조금나루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때문이다. ‘조금에도 배를 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때만’ 이용하던 나루라 해서 조금나루가 된 것이다.
탄도의 광활한 갯벌은 감동적이다. 매립과 간척으로 갯벌이 사라져가는 시대, 탄도 갯벌은 그 자체로 귀한 보물이다. 탄도 갯벌에서는 날마다 모세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난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쯤은 기적 축에도 끼지 못한다. 날마다 바다가 통째로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하는 갯벌. 기적이 일상인 섬. 탄도에는 집앞에뻘, 뒤뻘, 머시리뻘, 밥뻘, 작은뻘, 숭치뻘 등이 있는데 이 뻘에서 낙지와 감태, 석화, 농게 등이 난다. 탄도 갯벌은 1960년대까지 김장용 굴의 주산지였다. 수하식 굴양식이 보급되면서 탄도 갯벌의 토종 굴은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굴은 여전히 낙지, 감태와 함께 탄도 주민들의 주 소득원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탄도 갯벌은 감태로 명성이 드높았다. 탄도 감태가 유명한 것은 갯벌이 기름져서다. 특히 탄도 갯벌의 찰감태는 무안 장에서도 최고로 쳤다. 탄도 갯벌에는 두 종류의 감태가 자라는데 하나는 찰감태, 또 하나는 그냥 감태다. 흔히 감태는 매생이보다 식감이 거칠지만 찰감태는 매생이처럼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 일반 감태는 곧게 뻗어서 자란다 해서 뻐드래기라고도 한다. 식감도 약간 뻣뻣하다. 반면에 찰감태는 약간 꼬불꼬불하게 자라면서 봄이 되면 잎이 파래처럼 넓어진다. 하지만 부드러운 맛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탄도 사람들은 찰감태를 선호한다. “뻐드래기가 보리밥이라면 찰감태는 쌀밥”이라고 한다. 비단처럼 부드럽다고도 한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나오는 찰감태를 최상품으로 친다. 이때 나오는 감태가 새순이라 더 부드럽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감태를 기계로 세척하지만 탄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찬물에 손을 담가 뻘물을 빼낸다. 기계로 씻으면 감태 고유의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탄도 감태 무침은 그 짙은 바다 향이 살아 있다.
작은 섬이지만 탄도는 땅이 비옥하고 농작물이 실하다. 탄도에서 생산되는 마늘이나 양파는 그 씨알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크다. 무슨 특별한 토양도 아니고 옥토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땅에서 어찌 그런 수확이 가능할까. 탄도 이장님은 “큰 배가 다니기 어려워 비료 같은 것도 뭍에서 들여오기가 쉽지 않아 비료도 많이 못 주는데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땅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추정할 뿐이다. 비료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말에 순간 딱 드는 생각. 바로 그게 아닐까.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것이 작물을 잘되게 한 원인이 아닐까.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 토양이 황폐해진다. 그런데 비료를 잘 안 쓰니 퇴비를 많이 썼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땅을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 농작물을 잘되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탄도는 생김새가 용 모양이라 한다. 그래서 탄도에는 용과 관련한 지명도 여럿이다. 용머리 해안도 있고 용샘이란 이름의 둠벙도 있다. 용머리 해안 앞에는 여의주도 있다. 용머리 앞 동그랗게 보이는 작은 무인도의 이름이 야광주도(夜光珠島)다. 탄도와 야광주도 사이에도 물이 빠지면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이 길을 닻줄이라 부른다. 야광주란 암흑 속에서도 빛을 낸다는 기석이다. 밤에도 빛나는 구슬. 야광주도는 그래서 여의주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