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조용한 섬에서 느긋하게 걷고 싶다면 단연 울도를 추천한다. 울도에는 울도 숲길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길이 울도 당산으로 향하는 길이다. 선갑도, 지도, 백아도, 굴업도와 이에 딸린 무인도까지 덕적군도의 여러 섬들과 울도 북망산 능선까지 모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길들은 수풀이 무성한 곳들도 있는데 그만큼 인적이 드물다는 뜻이다. 코스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 여유롭게 걷기 좋은 길이다.

울섬, 울도는 덕적군도의 외곽 섬이다. 울도항에 들어서면 거대한 방파제가 울도 앞바다를 감싸고 있지만 방파제 안은 텅 빈 것처럼 황량하다. 1톤 남짓한 전마선만 몇 척 눈에 띌 뿐 큰 어선은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 선착장 인근 물양장에는 그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다들 어디로 간 것 일까. 출어를 나가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다. 울도 항은 봄 꽃게 철에만 인천 등 외지에서 온 꽃게 선단의 중간 기항지나 피항지 역할을 할 뿐 그 외에는 늘 비어 있다. 과거 울도 근해는 새우어장으로 명성을 떨쳤고 파시가 서면 전국 각지에서 수백척의 어선들이 물려들어 성황을 이루었었지만 먼 옛 이야기일 뿐 과거의 영화는 흔적조차 없다.
지금 섬 주민들 중에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은 어선 몇 척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고 조업 기간도 한 달에 10여일 남짓에 불과하다. 한때는 섬 주민의 배만 50척도 넘게 있었지만 울도 근해 어장이 황폐화 되면서 어선들도 사라지고 인구도 줄어들었다. 이제는 거의 노인들만 남았다. 주민들은 대부분 굴이나 홍합, 조개 등 해산물을 조금씩 채취하거나 산나물을 캐거나 비탈 밭을 일구고 산다. 그 외에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해양쓰레기 청소도 소득원이다. 또 봄 꽃게잡이 철이면 인천 선적 어선들의 꽃게 그물을 보수해 주며 일당벌이를 한다. 하지만 다들 부정기적이고 잠깐씩이다. 고정적인 수입원은 못되는 것들이다. 섬은 바다가 있어도 바다에 크게 기대지 못하고 산다.
목넘어를 비롯해 울도에서는 이따금 유골이 발견되곤 했다. 그러다보니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많다.
“귀신이 따라오면서 같이 가자고 했데”
그래서 어떤 이는 귀신에 홀려 목넘어 부근의 어떤 바위에 매달린 채 밤을 새기도 했다 한다. 목넘어는 큰 마을에서 작은 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의 중간에 있다. 1970년대 말쯤 목넘어에서는 일본인들의 유골이 발굴됐었다.
“도장도 나오고 뼈도 나오고 그랬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유골을 발굴해 갔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패전해서 퇴각하면서 울도 근해에서 배가 침몰해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그들의 시신이 울도로 흘러들어 온 것을 주민들이 묻어주었다고 전한다. 그들의 후손들이 유골을 찾으러 왔던 것이다. 목넘어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와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울도 배를 타는 선원의 색시가 따라와 살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했었다.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는 북망산에서도 공사 중에 일본군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지금은 폐교된 울도 초등학교를 지을 무렵 터파기를 하던 중에도 유골이 발견됐었다. 그러니 울도에 귀신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해할만하다.
울도는 큰 마을과 작은 마을 두 마을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큰 마을에 몰려 산다. 작은 마을인 살막금에는 지금 겨우 서너 가구 남아 있지만 한때는 큰마을 보다 더 융성했었다. 울도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큰 마을도의 집들도 산비탈에 위태롭게 들어서 있다. 할머니 한분, 삽과 괭이로 비탈 밭 한 뙈기 일구고 계신다.
“비가 안와 갖고 말라서 땅이 깡깡하네.”
마른 땅을 갈아엎어 시금치 씨앗을 뿌리실 요량이다.
“가을에 싱게 놓면 명절 넘어 실컷 먹어요.”
울도에는 갈아먹을 밭도 별로 없다. 산비탈 밭에 채전이나 일구는 정도다. 논은 한 평도 없어서 쌀은 전부 육지서 사다 먹는다. 마을에는 구멍가게도 없다. 덕적도의 슈퍼에 주문을 하면 여객선편에 보내준다. 하지만 폭풍주의보가 내려 여러 날 배가 안 뜨면 그마저도 어렵다. 노인은 충남 서산이 고향이다. 소녀 시절 울도 초등학교에 교감선생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평생을 눌러 살게 됐다. 소녀가 열일곱 살이 되자 울도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놓고 아버지는 이작도로 전근을 가버렸다.
“나는 여기에 갇혀갖고 이런 거 하고 살지요.”
그때는 다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라 한 입 덜어내기 위해 일찍들 시집을 보내곤 했었다. 전쟁 직후라 교사들도 아이들 월사금을 받아 생활했는데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월사금을 못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교육청에서 월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난 뒤였다 한다.
결혼 후에는 내내 뱃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큰 배들은 여자들을 금기시 하던 시절이었지만 가족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작은 어선들은 그런 금기가 없어서 다들 부부가 뱃일을 다녔다.
“배 쪼그만 한 거 사가지고 낚시질해서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큰 꽃게 배를 했지요.“
울도 바다에 꽃게와 젓새우 등이 한참 잘 잡히던 호시절이었다. 잡아온 꽃게는 운반선에 실어 인천으로 보내면 어판장에서 상인들에게 팔려나갔다. 꽃게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켰다. 영감은 18년 전에 세상을 뜨셨고 자식들은 인천에 산다. 자식들 집에 있어보기도 했지만 답답해서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
“인천 아파트 같은데 있으면 새 잡아다 새장에 넣은 것 모냥 깝깝해서 못살아요. 흙 만져 가며 살아야 건강하고. 내가 7학년 8반인디 이런 거, 흙 만지고 사니까 건강하요.“
노인은 움직일 힘이 있는 한 자식들에게 얹혀살 생각이 없다.
“혼자 사는 게 젤 좋아요. 애들이 오라고 오라고 해요. 내가 능력 없을 때 가야지. 능력 있으니 있어야죠. 지금부터 애들한테 신세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못 움직이게 되면 가야지.”
노인은 아파트 생활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실으신 게다. 아마도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식들에게 가지 않으실지 모른다. 몸 불편해서 가면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분명 할 테니 말이다.
울도는 옹진군 덕적면의 섬이다. 면적은 2.11㎢, 해안선 12.7㎞의 작은 섬.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71㎞, 덕적도에서는 남서쪽으로 23㎞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실상 충남 땅이 더 가깝다. 이 섬 앞바다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새우어장으로 유명했다. 덕적팔경 중 하나가 울도어화(蔚島漁火)인 것은 모두 이 새우잡이배들 덕분이었다. 울도 어장에서 밤 조업을 하며 새우잡이 배들이 켜놓은 불빛을 이르는 말이었다. 덕적도 돈은 다 울도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울도 새우어장은 1900년, 소야도의 조덕기 씨 등이 발견했다. 울도에서는 해마다 3월 중순이면 새우파시는 섰다. 파시는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말까지 크게 번성했다. 파시가 서면 울도는 온통 ‘술집 천지”였다.
파시 때 잡은 새우들은 건하로 말려서 포장한 뒤 중국의 칭다오, 다롄, 톈진, 상하이 등지로 수출됐다. 당시에는 중국 상인들이 건하를 수매하기 위해 덕적도에 상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울도 새우파시도 막을 내렸다. 건하 중국 수출길이 막힌 뒤 울도 어장에서 잡힌 새우는 젓새우로 팔려 나갔다. 덕적면 어업조합에서는 울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싣고 가는 소금가마 숫자에 따라 어업세를 매겼다. 잡은 새우는 배에서 바로 소금에 절여 젓새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어획량의 척도였다. 젓새우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상회를 통해 거래됐다. 울도의 젓새우는 대부분 부평의 새우젓 토굴로 보내져 토굴 속에서 숙성된 뒤 팔려 나갔다. 울도 주민들은 충남 당진, 서산, 홍성 등지로 나가 새우젓으로 쌀 등의 곡식을 바꿔다 먹고 살았다.
이 바다는 또 민어 어장이기도 해서 근처 굴업도에는 민어파시가 섰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새우도 잡히지 않고 새우를 주먹이로 삼는 민어도 잡히지 않는다. 지나친 남획으로 어족의 씨가 마른 때문이다. 40여 년 전부터 울도 어장도 텅 비었다. 그래서 지금 울도에는 5척의 작은 어선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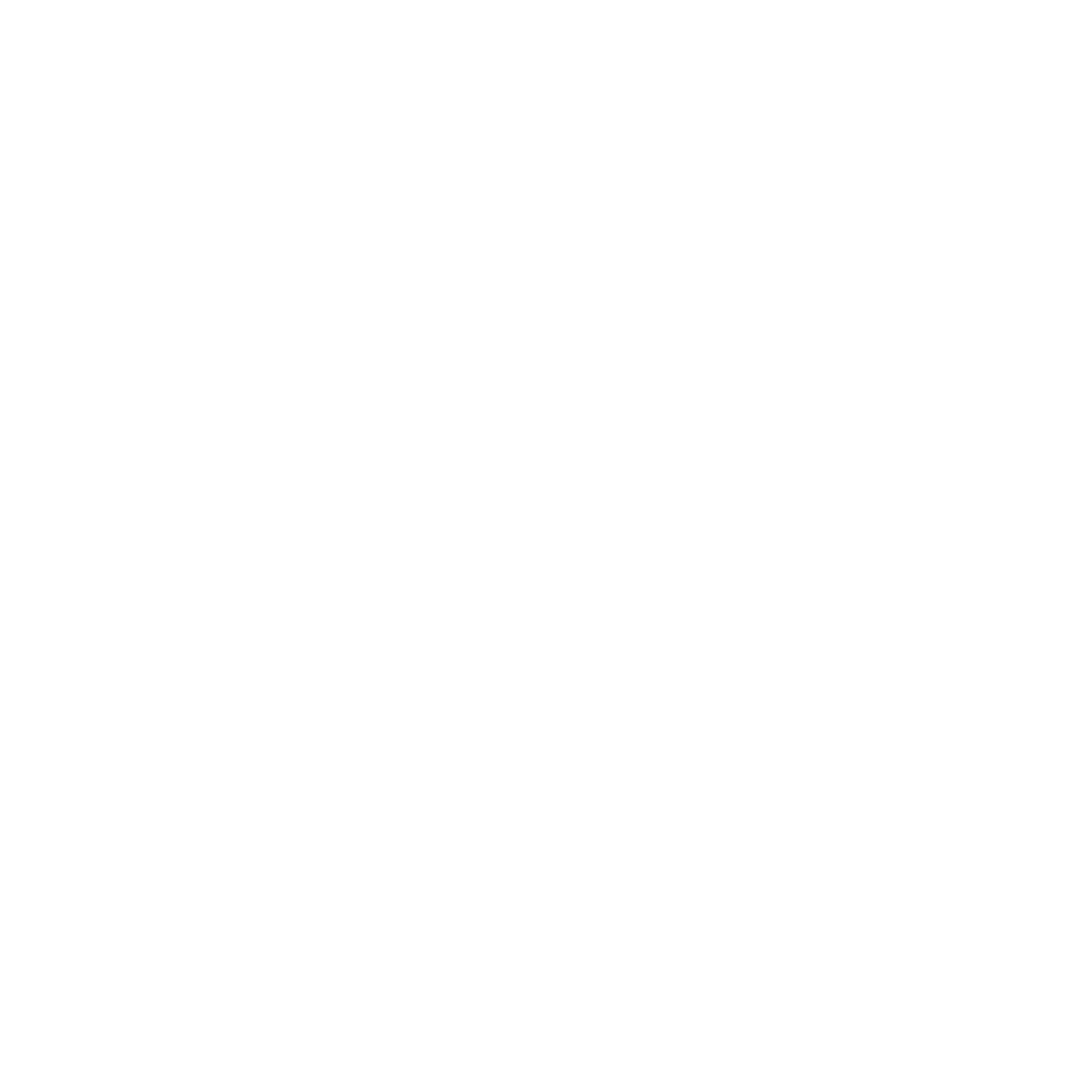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아주 조용한 섬에서 느긋하게 걷고 싶다면 단연 울도를 추천한다. 울도에는 울도 숲길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길이 울도 당산으로 향하는 길이다. 선갑도, 지도, 백아도, 굴업도와 이에 딸린 무인도까지 덕적군도의 여러 섬들과 울도 북망산 능선까지 모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길들은 수풀이 무성한 곳들도 있는데 그만큼 인적이 드물다는 뜻이다. 코스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 여유롭게 걷기 좋은 길이다.
울섬, 울도는 덕적군도의 외곽 섬이다. 울도항에 들어서면 거대한 방파제가 울도 앞바다를 감싸고 있지만 방파제 안은 텅 빈 것처럼 황량하다. 1톤 남짓한 전마선만 몇 척 눈에 띌 뿐 큰 어선은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 선착장 인근 물양장에는 그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다들 어디로 간 것 일까. 출어를 나가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다. 울도 항은 봄 꽃게 철에만 인천 등 외지에서 온 꽃게 선단의 중간 기항지나 피항지 역할을 할 뿐 그 외에는 늘 비어 있다. 과거 울도 근해는 새우어장으로 명성을 떨쳤고 파시가 서면 전국 각지에서 수백척의 어선들이 물려들어 성황을 이루었었지만 먼 옛 이야기일 뿐 과거의 영화는 흔적조차 없다.
지금 섬 주민들 중에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은 어선 몇 척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고 조업 기간도 한 달에 10여일 남짓에 불과하다. 한때는 섬 주민의 배만 50척도 넘게 있었지만 울도 근해 어장이 황폐화 되면서 어선들도 사라지고 인구도 줄어들었다. 이제는 거의 노인들만 남았다. 주민들은 대부분 굴이나 홍합, 조개 등 해산물을 조금씩 채취하거나 산나물을 캐거나 비탈 밭을 일구고 산다. 그 외에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해양쓰레기 청소도 소득원이다. 또 봄 꽃게잡이 철이면 인천 선적 어선들의 꽃게 그물을 보수해 주며 일당벌이를 한다. 하지만 다들 부정기적이고 잠깐씩이다. 고정적인 수입원은 못되는 것들이다. 섬은 바다가 있어도 바다에 크게 기대지 못하고 산다.
목넘어를 비롯해 울도에서는 이따금 유골이 발견되곤 했다. 그러다보니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많다.
“귀신이 따라오면서 같이 가자고 했데”
그래서 어떤 이는 귀신에 홀려 목넘어 부근의 어떤 바위에 매달린 채 밤을 새기도 했다 한다. 목넘어는 큰 마을에서 작은 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의 중간에 있다. 1970년대 말쯤 목넘어에서는 일본인들의 유골이 발굴됐었다.
“도장도 나오고 뼈도 나오고 그랬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유골을 발굴해 갔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패전해서 퇴각하면서 울도 근해에서 배가 침몰해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그들의 시신이 울도로 흘러들어 온 것을 주민들이 묻어주었다고 전한다. 그들의 후손들이 유골을 찾으러 왔던 것이다. 목넘어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와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울도 배를 타는 선원의 색시가 따라와 살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했었다.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는 북망산에서도 공사 중에 일본군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지금은 폐교된 울도 초등학교를 지을 무렵 터파기를 하던 중에도 유골이 발견됐었다. 그러니 울도에 귀신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해할만하다.
울도는 큰 마을과 작은 마을 두 마을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큰 마을에 몰려 산다. 작은 마을인 살막금에는 지금 겨우 서너 가구 남아 있지만 한때는 큰마을 보다 더 융성했었다. 울도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큰 마을도의 집들도 산비탈에 위태롭게 들어서 있다. 할머니 한분, 삽과 괭이로 비탈 밭 한 뙈기 일구고 계신다.
“비가 안와 갖고 말라서 땅이 깡깡하네.”
마른 땅을 갈아엎어 시금치 씨앗을 뿌리실 요량이다.
“가을에 싱게 놓면 명절 넘어 실컷 먹어요.”
울도에는 갈아먹을 밭도 별로 없다. 산비탈 밭에 채전이나 일구는 정도다. 논은 한 평도 없어서 쌀은 전부 육지서 사다 먹는다. 마을에는 구멍가게도 없다. 덕적도의 슈퍼에 주문을 하면 여객선편에 보내준다. 하지만 폭풍주의보가 내려 여러 날 배가 안 뜨면 그마저도 어렵다. 노인은 충남 서산이 고향이다. 소녀 시절 울도 초등학교에 교감선생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평생을 눌러 살게 됐다. 소녀가 열일곱 살이 되자 울도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놓고 아버지는 이작도로 전근을 가버렸다.
“나는 여기에 갇혀갖고 이런 거 하고 살지요.”
그때는 다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라 한 입 덜어내기 위해 일찍들 시집을 보내곤 했었다. 전쟁 직후라 교사들도 아이들 월사금을 받아 생활했는데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월사금을 못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교육청에서 월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난 뒤였다 한다.
결혼 후에는 내내 뱃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큰 배들은 여자들을 금기시 하던 시절이었지만 가족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작은 어선들은 그런 금기가 없어서 다들 부부가 뱃일을 다녔다.
“배 쪼그만 한 거 사가지고 낚시질해서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큰 꽃게 배를 했지요.“
울도 바다에 꽃게와 젓새우 등이 한참 잘 잡히던 호시절이었다. 잡아온 꽃게는 운반선에 실어 인천으로 보내면 어판장에서 상인들에게 팔려나갔다. 꽃게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켰다. 영감은 18년 전에 세상을 뜨셨고 자식들은 인천에 산다. 자식들 집에 있어보기도 했지만 답답해서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
“인천 아파트 같은데 있으면 새 잡아다 새장에 넣은 것 모냥 깝깝해서 못살아요. 흙 만져 가며 살아야 건강하고. 내가 7학년 8반인디 이런 거, 흙 만지고 사니까 건강하요.“
노인은 움직일 힘이 있는 한 자식들에게 얹혀살 생각이 없다.
“혼자 사는 게 젤 좋아요. 애들이 오라고 오라고 해요. 내가 능력 없을 때 가야지. 능력 있으니 있어야죠. 지금부터 애들한테 신세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못 움직이게 되면 가야지.”
노인은 아파트 생활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실으신 게다. 아마도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식들에게 가지 않으실지 모른다. 몸 불편해서 가면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분명 할 테니 말이다.
울도는 옹진군 덕적면의 섬이다. 면적은 2.11㎢, 해안선 12.7㎞의 작은 섬.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71㎞, 덕적도에서는 남서쪽으로 23㎞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실상 충남 땅이 더 가깝다. 이 섬 앞바다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새우어장으로 유명했다. 덕적팔경 중 하나가 울도어화(蔚島漁火)인 것은 모두 이 새우잡이배들 덕분이었다. 울도 어장에서 밤 조업을 하며 새우잡이 배들이 켜놓은 불빛을 이르는 말이었다. 덕적도 돈은 다 울도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울도 새우어장은 1900년, 소야도의 조덕기 씨 등이 발견했다. 울도에서는 해마다 3월 중순이면 새우파시는 섰다. 파시는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말까지 크게 번성했다. 파시가 서면 울도는 온통 ‘술집 천지”였다.
파시 때 잡은 새우들은 건하로 말려서 포장한 뒤 중국의 칭다오, 다롄, 톈진, 상하이 등지로 수출됐다. 당시에는 중국 상인들이 건하를 수매하기 위해 덕적도에 상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울도 새우파시도 막을 내렸다. 건하 중국 수출길이 막힌 뒤 울도 어장에서 잡힌 새우는 젓새우로 팔려 나갔다. 덕적면 어업조합에서는 울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싣고 가는 소금가마 숫자에 따라 어업세를 매겼다. 잡은 새우는 배에서 바로 소금에 절여 젓새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어획량의 척도였다. 젓새우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상회를 통해 거래됐다. 울도의 젓새우는 대부분 부평의 새우젓 토굴로 보내져 토굴 속에서 숙성된 뒤 팔려 나갔다. 울도 주민들은 충남 당진, 서산, 홍성 등지로 나가 새우젓으로 쌀 등의 곡식을 바꿔다 먹고 살았다.
이 바다는 또 민어 어장이기도 해서 근처 굴업도에는 민어파시가 섰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새우도 잡히지 않고 새우를 주먹이로 삼는 민어도 잡히지 않는다. 지나친 남획으로 어족의 씨가 마른 때문이다. 40여 년 전부터 울도 어장도 텅 비었다. 그래서 지금 울도에는 5척의 작은 어선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