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침략 당시 당나라군 30만이 주둔했던 섬 덕적도. 덕적도 운주봉길은 해변 산중, 산과 갯벌과 백사장으로 이어지는 섬길이다. 진리항에서 적송림 울창한 숲길을 거쳐 서포리 해수욕장에 이르는 코스로, 운주봉 정상에 오르면 덕적도 인근 바다에 흩뿌려 놓은 듯 크고 작은 섬들이 장관을 이룬다. 서포리 홍송숲은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숲이다. 솔숲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는다.

덕적도에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토였으나 한강 유역의 다른 지역처럼 신라와 고구려에게 번갈아 점령당했던 경계의 땅이었다. 덕적도는 고대 황해 횡단항로의 길목이기도 했다. 당나라의 백제 침략 때 덕적군도(群島)는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의 전진기지였다. 660년, 수륙 13만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 침략에 나선 소정방의 당나라군은 4개월간 덕적군도를 13만 군대의 주둔지 겸 군수품 보급기지로 활용했다. 덕적도 바로 옆 소야도에는 당나라군의 진지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남아있다. 당나라 침략자들은 덕적도에 주둔했다가 기벌포로 상륙해 신라와 협공으로 백제를 멸망시켰다.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왜구들 때문에 섬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도(空島)가 되었다.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다. 그런 덕적도가 수려한 경관으로도 이름 높았다.
“덕적도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할 때 군사를 주둔시켰던 곳이다. 뒤에 있는 3개의 돌봉우리는 하늘에 꽂힌 듯하다. 여러 산기슭이 빙 둘러싸고 안쪽은 두 갈래진 항구로 되어있는데 물이 얕아도 배를 댈 만하다. 나는 듯한 샘물이 높은 데서 쏟아져 내리고 평평한 냇물이 둘렸으며 층바위와 반석이 굽이굽이 맑고 기이하다. 매년 봄과 여름이면 진달래와 철쭉꽃이 산에 가득 피어 골과 구렁 사이가 붉은 비단 같다. 바닷가는 모두 흰 모래밭이고 가끔 해당화가 모래를 뚫고 올라와 빨갛게 핀다. 비록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라도 참으로 선경이다. 주민들은 모두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어 부유한 자가 많다. 여러 섬에 장기 있는 샘이 많은데 덕적도와 군산도에는 없다.” (이중환 <택리지(擇里志)>)
과거 덕적도는 덕물도, 득물도 등 여러 이름으로도 불렸다. 면적 20.87㎢, 여의도의 4.5배쯤 되는 큰 섬이다. 2009년 1월5일, 덕적면 전체 인구는 1800명. 덕적도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옛 자료에 따르면 1954년 덕적도의 인구는 1만2788명. 한국전쟁 직후라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원주민과 피난민이 반반. 무속을 제외하면 당시에도 종교는 기독교가 대세였다. 기독교인은 500여명이나 됐지만 절은 선갑도에 하나뿐이었고 그 절에도 신도가 없이 파계승만 1인이 거주했다. 당시 덕적군도 전체에 라디오는 25대였고, 신문은 110부를 구독했다. <인천신문> 50부. <연합신문> 30부, <조선일보> 30부, 신문은 대부분이 유지들과 관공서에서 구독했다. 미군부대도 주둔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담배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좌판이 2~3개 있었다. 섬에는 의사 3, 한의사 2, 수의사 1명과 의생 3명이 살았다. 현재와는 또 다른 덕적도의 옛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과거 덕적도는 연평도와 함께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업전진기지였다. 그 중심에 북리가 있었다. 연평도 파시만큼은 아니었으나 북리에도 규모가 큰 파시가 섰다. 그런 연유로 북리에는 부잣집이 많았다. 상징으로 남은 건물이 망루 같은 2층집이다. 2층 선주집은 덕적도 북리에만 있던 부의 상징이다. 지금도 몇몇 2층집은 사람이 살고 있다. 2층은 전체가 하나의 넓은 방이다. 바닥은 널마루를 깔았다. 난방시설이 없는 방은 여름용이다. 건물은 방이라기보다 누각에 가깝다. 사방에 유리창을 달았고 각 방향마다 두개씩의 창문을 넣어 어느 방향이나 전망이 툭 트였다. 선주는 이곳 마루에 앉아 북리항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배를 기다렸다. 만선의 북소리가 울리면 고 선원들을 위한 잔치 준비를 서둘렀다.
민어의 산란장이었던 덕적바다. 6,7월 민어철이면 덕적도 북리항에는 수백척의 어선들이 몰려들고 색주가만 수십곳이 생겼다. 예부터 이름난 민어어장은 신안의 태이도(타리도)와 재원도, 인천의 덕적도, 평안도 신도 바다였다. 과거 한국의 바다에 사는 민어는 가을이면 제주도 근해로 이동하여 월동하고, 봄이면 북쪽으로 돌아와 생활했다. 여름철 덕적도 근해는 민어의 산란장이었다. 민어는 <동국여지승람>에 덕적도의 특산물로 거론될 정도로 덕적도 바다의 대표적 어종이었다.
과거 덕적도에는 어업과 관련된 금기가 많았다. 어느 지방이나 그랬듯이 여자들은 어선에 타지 못했다. 심지어 출어하는 날 아침에 여자를 만나면 ‘재수없다’하여 출어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배에는 소, 돼지,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일절 싣지 못했다. 애기를 낳은 집의 선원은 ‘부정간다’ 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배를 탈 수 없었다. 아이를 낳고 3일 전에 어선이 출어할 경우에는 복숭아나무가지를 잘라서 들고 배를 탔다. 그러면 부정이 방지된다고 믿었다. 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온 선원이 초상집을 다녀오면 자기집 방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부정을 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궁이 속에 고개를 집어넣었다가 나와서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어민들에게 금기는 기독교의 십계명이나 불교의 계율과 다르지 않았다. 어로활동에는 날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부들은 자연의 징후를 보고 다음날 날씨를 미리 짐작했다. 봄에 서남풍이 불면 반드시 비가 온다 했다. 안개낀 날 멀리서 기계소리는 나지만 배 모양이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했다. 또 먼 산이 가깝게 보이면 비가 온다고 했다. 낙조 때 서쪽 바다가 붉게 물들면 비가 오고 능구렁이가 울어도 비가 오고 쌍무지개가 떠도 비가 온다고 했다. 머리가 가려워도 비가 온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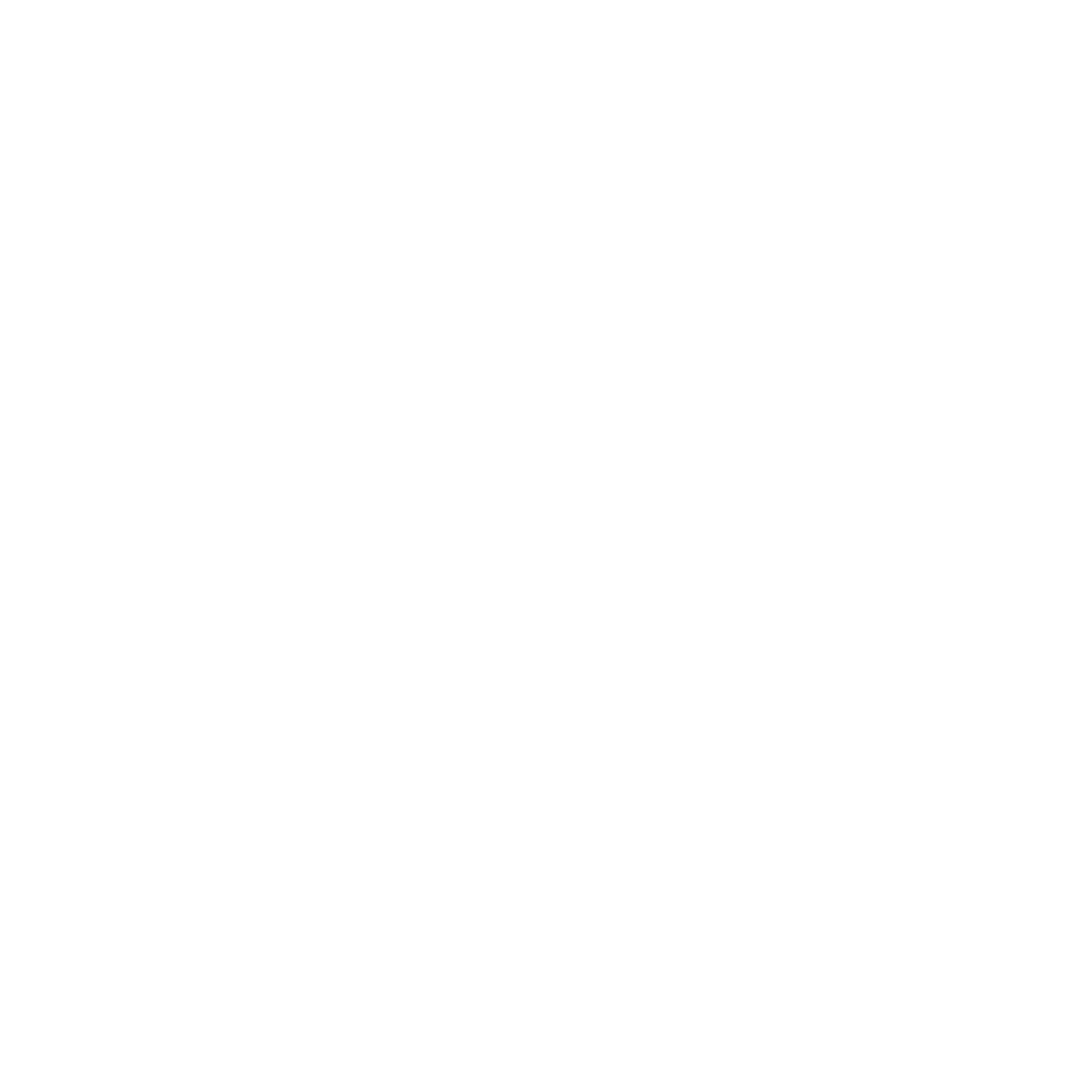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백제 침략 당시 당나라군 30만이 주둔했던 섬 덕적도. 덕적도 운주봉길은 해변 산중, 산과 갯벌과 백사장으로 이어지는 섬길이다. 진리항에서 적송림 울창한 숲길을 거쳐 서포리 해수욕장에 이르는 코스로, 운주봉 정상에 오르면 덕적도 인근 바다에 흩뿌려 놓은 듯 크고 작은 섬들이 장관을 이룬다. 서포리 홍송숲은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숲이다. 솔숲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는다.
덕적도에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토였으나 한강 유역의 다른 지역처럼 신라와 고구려에게 번갈아 점령당했던 경계의 땅이었다. 덕적도는 고대 황해 횡단항로의 길목이기도 했다. 당나라의 백제 침략 때 덕적군도(群島)는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의 전진기지였다. 660년, 수륙 13만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 침략에 나선 소정방의 당나라군은 4개월간 덕적군도를 13만 군대의 주둔지 겸 군수품 보급기지로 활용했다. 덕적도 바로 옆 소야도에는 당나라군의 진지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남아있다. 당나라 침략자들은 덕적도에 주둔했다가 기벌포로 상륙해 신라와 협공으로 백제를 멸망시켰다.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왜구들 때문에 섬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도(空島)가 되었다.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다. 그런 덕적도가 수려한 경관으로도 이름 높았다.
“덕적도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할 때 군사를 주둔시켰던 곳이다. 뒤에 있는 3개의 돌봉우리는 하늘에 꽂힌 듯하다. 여러 산기슭이 빙 둘러싸고 안쪽은 두 갈래진 항구로 되어있는데 물이 얕아도 배를 댈 만하다. 나는 듯한 샘물이 높은 데서 쏟아져 내리고 평평한 냇물이 둘렸으며 층바위와 반석이 굽이굽이 맑고 기이하다. 매년 봄과 여름이면 진달래와 철쭉꽃이 산에 가득 피어 골과 구렁 사이가 붉은 비단 같다. 바닷가는 모두 흰 모래밭이고 가끔 해당화가 모래를 뚫고 올라와 빨갛게 핀다. 비록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라도 참으로 선경이다. 주민들은 모두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어 부유한 자가 많다. 여러 섬에 장기 있는 샘이 많은데 덕적도와 군산도에는 없다.” (이중환 <택리지(擇里志)>)
과거 덕적도는 덕물도, 득물도 등 여러 이름으로도 불렸다. 면적 20.87㎢, 여의도의 4.5배쯤 되는 큰 섬이다. 2009년 1월5일, 덕적면 전체 인구는 1800명. 덕적도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옛 자료에 따르면 1954년 덕적도의 인구는 1만2788명. 한국전쟁 직후라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원주민과 피난민이 반반. 무속을 제외하면 당시에도 종교는 기독교가 대세였다. 기독교인은 500여명이나 됐지만 절은 선갑도에 하나뿐이었고 그 절에도 신도가 없이 파계승만 1인이 거주했다. 당시 덕적군도 전체에 라디오는 25대였고, 신문은 110부를 구독했다. <인천신문> 50부. <연합신문> 30부, <조선일보> 30부, 신문은 대부분이 유지들과 관공서에서 구독했다. 미군부대도 주둔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담배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좌판이 2~3개 있었다. 섬에는 의사 3, 한의사 2, 수의사 1명과 의생 3명이 살았다. 현재와는 또 다른 덕적도의 옛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과거 덕적도는 연평도와 함께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업전진기지였다. 그 중심에 북리가 있었다. 연평도 파시만큼은 아니었으나 북리에도 규모가 큰 파시가 섰다. 그런 연유로 북리에는 부잣집이 많았다. 상징으로 남은 건물이 망루 같은 2층집이다. 2층 선주집은 덕적도 북리에만 있던 부의 상징이다. 지금도 몇몇 2층집은 사람이 살고 있다. 2층은 전체가 하나의 넓은 방이다. 바닥은 널마루를 깔았다. 난방시설이 없는 방은 여름용이다. 건물은 방이라기보다 누각에 가깝다. 사방에 유리창을 달았고 각 방향마다 두개씩의 창문을 넣어 어느 방향이나 전망이 툭 트였다. 선주는 이곳 마루에 앉아 북리항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배를 기다렸다. 만선의 북소리가 울리면 고 선원들을 위한 잔치 준비를 서둘렀다.
민어의 산란장이었던 덕적바다. 6,7월 민어철이면 덕적도 북리항에는 수백척의 어선들이 몰려들고 색주가만 수십곳이 생겼다. 예부터 이름난 민어어장은 신안의 태이도(타리도)와 재원도, 인천의 덕적도, 평안도 신도 바다였다. 과거 한국의 바다에 사는 민어는 가을이면 제주도 근해로 이동하여 월동하고, 봄이면 북쪽으로 돌아와 생활했다. 여름철 덕적도 근해는 민어의 산란장이었다. 민어는 <동국여지승람>에 덕적도의 특산물로 거론될 정도로 덕적도 바다의 대표적 어종이었다.
과거 덕적도에는 어업과 관련된 금기가 많았다. 어느 지방이나 그랬듯이 여자들은 어선에 타지 못했다. 심지어 출어하는 날 아침에 여자를 만나면 ‘재수없다’하여 출어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배에는 소, 돼지,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일절 싣지 못했다. 애기를 낳은 집의 선원은 ‘부정간다’ 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배를 탈 수 없었다. 아이를 낳고 3일 전에 어선이 출어할 경우에는 복숭아나무가지를 잘라서 들고 배를 탔다. 그러면 부정이 방지된다고 믿었다. 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온 선원이 초상집을 다녀오면 자기집 방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부정을 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궁이 속에 고개를 집어넣었다가 나와서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어민들에게 금기는 기독교의 십계명이나 불교의 계율과 다르지 않았다. 어로활동에는 날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부들은 자연의 징후를 보고 다음날 날씨를 미리 짐작했다. 봄에 서남풍이 불면 반드시 비가 온다 했다. 안개낀 날 멀리서 기계소리는 나지만 배 모양이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했다. 또 먼 산이 가깝게 보이면 비가 온다고 했다. 낙조 때 서쪽 바다가 붉게 물들면 비가 오고 능구렁이가 울어도 비가 오고 쌍무지개가 떠도 비가 온다고 했다. 머리가 가려워도 비가 온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