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도는 2012년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33개 섬’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아늑하고 원시적 해안이 있는 섬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적 해안은 몽돌자갈밭해변을 말한다. 섬 주변의 조류가 빨라 파도에 씻긴 몽돌들이 해안선을 따라 쫙 깔려있고, 바로 그 뒷편으로는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차원의 세계에 와있는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보령시 효자도는 어미 섬 원산도와 지척이다. 마주선 두 섬 사이 바다는 강처럼 폭이 좁다. 원산도를 출항한 여객선이 뱃머리를 돌리는가 싶더니 금새 효자도 선착장에 가 닿는다. 섬의 안길로 들어서자 섬 한가운데 제법 너른 들이 있다. 분지처럼 보이지만 이 들판은 본디 갯벌이었다. 100년 전 주민들이 간척을 해서 논을 만들었다. 수산물보다 쌀이 귀한 시절의 유물이다. 오늘 효자도 들판의 벼들은 다들 모로 누웠다. 태풍에 쓰러진 벼들. 허리가 제대로 꺾여 일으켜 세울 수 없으니 누운 채로 익어간다.
논길을 가로질러 작은 오솔길을 지나면 섬의 뒤안 명덕 마을이다. 갯돌 해변이 있는 마을 앞바다에는 우럭 가두리 양식장이 많다. 우럭 양시장의 수상 가옥 한 채. 대체로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를 그대로 가져다 두지만 이 집은 제법 꼴을 갖췄다. 양철지붕에 용마루까지 올렸으니 품격 있는 어엿한 집이다. 집 문 앞에는 하얀 개 한 마리 우두커니 서 있다. 양식장의 파수꾼. 녀석은 주인 없는 양식장을 지키며 종일토록 바다만 본다.
이 마을에서도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봄에는 실치를 잡고 가을이면 멸치를 잡는다. 봄철 실치잡이도 4월 한 달이듯이 가을 멸치잡이도 한 달 남짓이다. 멸치떼는 추석 무렵 몰려 왔다가 찬바람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따뜻한 남쪽 바다를 찾아가는 것이다. 멸치철이 지나면 또 한동안 갑오징어와 쭈꾸미, 꽃게가 든다. 이 또한 잠깐이다. 조금 젊은 축에 속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대천과 효자도 두 집 살림을 한다. 어장 철에는 주로 섬에 들어와 살고 비어기나 쉬는 때는 대천으로 간다. 섬이 직장이나 다름없다. 아이들도 모두 대천에서 학교에 다닌다.
멸치는 잡는 대로 배안에서 삶는다. 그래서 작은 어선들은 부부가 2인 1조로 작업한다. 남자가 그물을 올리면 여자가 삶는 것이다. 뭍으로 운반해 오는 사이 물기가 빠지면 널어서 말린다. 멸치의 주인일까. 여자는 빗자루 하나를 들고 말라가는 멸치를 뒤적이고 있다. 잘 마르라고 뒤집어 주는 것이다. 잘 마른 멸치는 새우와 꼴뚜기 같은 잡어를 골라낸 뒤 채로 깨끗이 처서 포장한다. 멸치 그물은 하루 두 번 물때에 맞춰 거두러 간다. 물의 들고남에 따라 사람도 들고 난다. 그래도 봄 한 달 실치잡이로 1천만 원, 가을철 한 달 멸치잡이로 또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니 “잠을 못 자고 사람 꼴은 아니어도” 엄청난 고소득이다. 실치는 삶지 않고 바로 떠서 말리지만 멸치는 삶아서 말리니 공정이 더 까다롭다.
비어기에는 살조개나 바지락을 캐거나 굴을 깬다. 여자는 바다일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짓고 수도 검침원 일까지 겸하니 도대체 쉴 틈이 없다. 남편은 어장을 보지 않는 때는 낚시 배를 운영 한다. 많이 벌지만 쓰자고 들면 쓸 게 없다.
“대천 같은 데 나가면 돈 우습게 나가요.”
바다에 벌어다 뭍에서 다 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큰 섬 원산도까지 통학선이 오고가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대천에서 다녀야 한다. 여자는 지금 대천에도 집이 있다. 그러나 여자의 아이들도 자랄 때는 대천에서 저희들끼리 자취하며 학교에 다녔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직장을 다닌다. 소득이 되니 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여자도 이제 쉰셋. 아이들이 다 컸어도 결혼시킬 일이 남았다.
“여워 주는 게 고생이죠. 책임이고. 짝 지어갖고 집이라도 장만해 줘야죠.”
그래서 여자는 아직까지 쉴 틈 없이 일한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 섬으로 시집 온 뒤에는 여행을 가본 적도 없다. 처음 섬에 왔을 때는 김발을 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바다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목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것이야 살면서 차차 적응이 됐으나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무엇보다 큰 걱정이었다. 지금은 섬에 목욕탕도 생기고 보건소도 생겨서 제법 살만해 졌다. 여자는 이제 아주 섬사람이 다 됐다. 섬살이가 재미있기까지 하다. 여자는 외항선 선원인 작은 아들 자랑이 하고 싶어 입이 간지럽다.
“장동건 같이 잘생겼어요.”
아들은 외항선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고 지금은 제 2항해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군대 대신 3년을 꼬박 배만 타야 했지만 돈을 제법 많이 버니까 군대 가는 거 보다 낫다. 그래도 아들이 외항선을 타면서 씀씀이가 헤퍼진 것은 걱정이다. 여자는 작은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심경이 아주 복잡하다.
“선원들이 외국 사람들이라 애가 잘못 풀렸어. 말 하는 것도 그렇고 예의가 없어요. 배 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색시 집에도 가고. 외국에 입항했을 때 술 먹으러 가면 자기만 빠질 수 없다 해요. 저는 맨날 술만 먹을 뿐이라지만 그게 그런가요. 남자들은 다 똑같지.”
증거가 있어서 하는 소리다. 여자는 휴가 나온 아들 때문에 깜짝 놀랬더랬다.
“가방을 정리해 주는데 콘돔이 있더라고.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여전히 애기 같기만 한데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 싶었다. 여자는 아들의 월급 대부분을 적금에 넣어 줬다. 그래도 1년에 두 달 휴가를 나오면 외항선 회사에서 5백만원 씩 휴가비가 나왔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다 손을 벌리는 것이 여자는 속상하다.
“엄청 속을 썩이네요. 우리들은 어디 놀러 한번 못가고 버는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큰 아들은 걱정을 끼치자 않아서 다행이다. 보일러공으로 일하는 큰 아들은 성당에 다니며 병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봉사 활동도 열심이다.
“작은놈 보다 인물이 빠지지만 착하고 성실해요.”
사람이 다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여자는 잘 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지만 자식들이 나쁜 길로 새지 않고 살아 주는 것만도 큰 행복이다. 여자는 오늘도 하염없이 멸치를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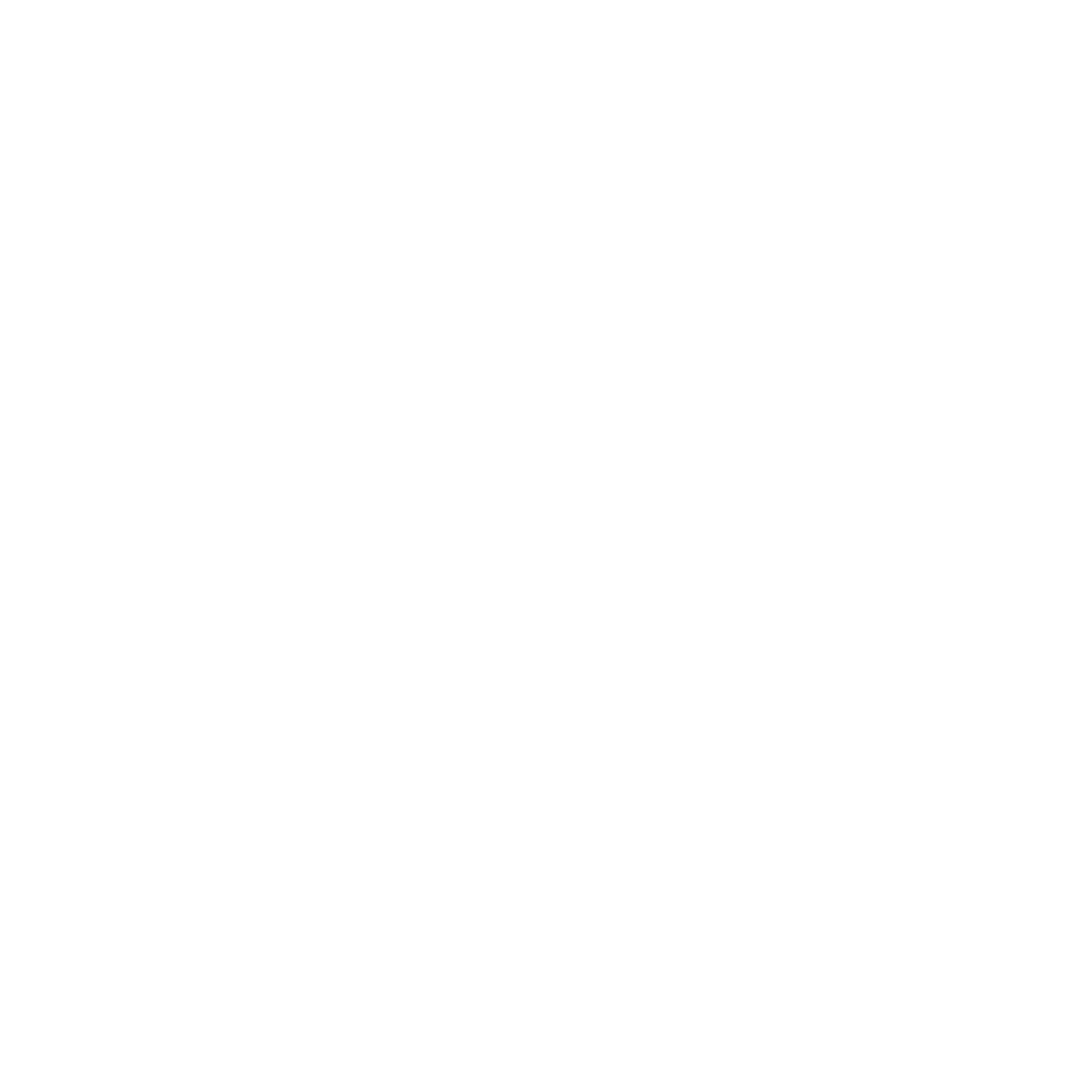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효자도는 2012년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33개 섬’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아늑하고 원시적 해안이 있는 섬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시적 해안은 몽돌자갈밭해변을 말한다. 섬 주변의 조류가 빨라 파도에 씻긴 몽돌들이 해안선을 따라 쫙 깔려있고, 바로 그 뒷편으로는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차원의 세계에 와있는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보령시 효자도는 어미 섬 원산도와 지척이다. 마주선 두 섬 사이 바다는 강처럼 폭이 좁다. 원산도를 출항한 여객선이 뱃머리를 돌리는가 싶더니 금새 효자도 선착장에 가 닿는다. 섬의 안길로 들어서자 섬 한가운데 제법 너른 들이 있다. 분지처럼 보이지만 이 들판은 본디 갯벌이었다. 100년 전 주민들이 간척을 해서 논을 만들었다. 수산물보다 쌀이 귀한 시절의 유물이다. 오늘 효자도 들판의 벼들은 다들 모로 누웠다. 태풍에 쓰러진 벼들. 허리가 제대로 꺾여 일으켜 세울 수 없으니 누운 채로 익어간다.
논길을 가로질러 작은 오솔길을 지나면 섬의 뒤안 명덕 마을이다. 갯돌 해변이 있는 마을 앞바다에는 우럭 가두리 양식장이 많다. 우럭 양시장의 수상 가옥 한 채. 대체로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를 그대로 가져다 두지만 이 집은 제법 꼴을 갖췄다. 양철지붕에 용마루까지 올렸으니 품격 있는 어엿한 집이다. 집 문 앞에는 하얀 개 한 마리 우두커니 서 있다. 양식장의 파수꾼. 녀석은 주인 없는 양식장을 지키며 종일토록 바다만 본다.
이 마을에서도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봄에는 실치를 잡고 가을이면 멸치를 잡는다. 봄철 실치잡이도 4월 한 달이듯이 가을 멸치잡이도 한 달 남짓이다. 멸치떼는 추석 무렵 몰려 왔다가 찬바람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따뜻한 남쪽 바다를 찾아가는 것이다. 멸치철이 지나면 또 한동안 갑오징어와 쭈꾸미, 꽃게가 든다. 이 또한 잠깐이다. 조금 젊은 축에 속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대천과 효자도 두 집 살림을 한다. 어장 철에는 주로 섬에 들어와 살고 비어기나 쉬는 때는 대천으로 간다. 섬이 직장이나 다름없다. 아이들도 모두 대천에서 학교에 다닌다.
멸치는 잡는 대로 배안에서 삶는다. 그래서 작은 어선들은 부부가 2인 1조로 작업한다. 남자가 그물을 올리면 여자가 삶는 것이다. 뭍으로 운반해 오는 사이 물기가 빠지면 널어서 말린다. 멸치의 주인일까. 여자는 빗자루 하나를 들고 말라가는 멸치를 뒤적이고 있다. 잘 마르라고 뒤집어 주는 것이다. 잘 마른 멸치는 새우와 꼴뚜기 같은 잡어를 골라낸 뒤 채로 깨끗이 처서 포장한다. 멸치 그물은 하루 두 번 물때에 맞춰 거두러 간다. 물의 들고남에 따라 사람도 들고 난다. 그래도 봄 한 달 실치잡이로 1천만 원, 가을철 한 달 멸치잡이로 또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니 “잠을 못 자고 사람 꼴은 아니어도” 엄청난 고소득이다. 실치는 삶지 않고 바로 떠서 말리지만 멸치는 삶아서 말리니 공정이 더 까다롭다.
비어기에는 살조개나 바지락을 캐거나 굴을 깬다. 여자는 바다일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짓고 수도 검침원 일까지 겸하니 도대체 쉴 틈이 없다. 남편은 어장을 보지 않는 때는 낚시 배를 운영 한다. 많이 벌지만 쓰자고 들면 쓸 게 없다.
“대천 같은 데 나가면 돈 우습게 나가요.”
바다에 벌어다 뭍에서 다 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큰 섬 원산도까지 통학선이 오고가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대천에서 다녀야 한다. 여자는 지금 대천에도 집이 있다. 그러나 여자의 아이들도 자랄 때는 대천에서 저희들끼리 자취하며 학교에 다녔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직장을 다닌다. 소득이 되니 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여자도 이제 쉰셋. 아이들이 다 컸어도 결혼시킬 일이 남았다.
“여워 주는 게 고생이죠. 책임이고. 짝 지어갖고 집이라도 장만해 줘야죠.”
그래서 여자는 아직까지 쉴 틈 없이 일한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 섬으로 시집 온 뒤에는 여행을 가본 적도 없다. 처음 섬에 왔을 때는 김발을 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바다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목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것이야 살면서 차차 적응이 됐으나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무엇보다 큰 걱정이었다. 지금은 섬에 목욕탕도 생기고 보건소도 생겨서 제법 살만해 졌다. 여자는 이제 아주 섬사람이 다 됐다. 섬살이가 재미있기까지 하다. 여자는 외항선 선원인 작은 아들 자랑이 하고 싶어 입이 간지럽다.
“장동건 같이 잘생겼어요.”
아들은 외항선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고 지금은 제 2항해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군대 대신 3년을 꼬박 배만 타야 했지만 돈을 제법 많이 버니까 군대 가는 거 보다 낫다. 그래도 아들이 외항선을 타면서 씀씀이가 헤퍼진 것은 걱정이다. 여자는 작은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심경이 아주 복잡하다.
“선원들이 외국 사람들이라 애가 잘못 풀렸어. 말 하는 것도 그렇고 예의가 없어요. 배 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색시 집에도 가고. 외국에 입항했을 때 술 먹으러 가면 자기만 빠질 수 없다 해요. 저는 맨날 술만 먹을 뿐이라지만 그게 그런가요. 남자들은 다 똑같지.”
증거가 있어서 하는 소리다. 여자는 휴가 나온 아들 때문에 깜짝 놀랬더랬다.
“가방을 정리해 주는데 콘돔이 있더라고.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여전히 애기 같기만 한데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 싶었다. 여자는 아들의 월급 대부분을 적금에 넣어 줬다. 그래도 1년에 두 달 휴가를 나오면 외항선 회사에서 5백만원 씩 휴가비가 나왔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다 손을 벌리는 것이 여자는 속상하다.
“엄청 속을 썩이네요. 우리들은 어디 놀러 한번 못가고 버는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큰 아들은 걱정을 끼치자 않아서 다행이다. 보일러공으로 일하는 큰 아들은 성당에 다니며 병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봉사 활동도 열심이다.
“작은놈 보다 인물이 빠지지만 착하고 성실해요.”
사람이 다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여자는 잘 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지만 자식들이 나쁜 길로 새지 않고 살아 주는 것만도 큰 행복이다. 여자는 오늘도 하염없이 멸치를 말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