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는 수선화 꽃섬이다. 4월 봄날, 수선화 꽃이 피면 섬 전체가 노랗게 물든다. 선도 수선화길은 수선화 꽃길과 대덕산 능선길을 이어 걷는 길이다. 선도항에서 출발해서 대덕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야트막해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발 밑에 펼쳐진 서해 바다 풍광이 아찔하다. 남쪽으로는 암태도와 자은도가, 북쪽으로는 저 멀리 영광 송이도까지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현지 실사단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라고 했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최근 선도는 수선화로 유명해졌다. 수선화 할머니로 불리는 현복순 할머니 덕이다.
할머니가 선도로 들어온 것은 삼십 몇 년 전이다. 선도는 남편의 고향이었다. 아내의 고향은 목포. 남편은 12년 전, 80세로 세상을 하직했다. 선도 최고 부잣집 아들이었던 남편은 고려대학을 졸업했고 아내는 목포에서 여고(여중여고통합과정)를 졸업했다. 아내도 ‘큰 기와집’이라 불리던 목포의 부잣집 둘째 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하지만 남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은 목포에서 교사를 했고 부산에서는 법원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객지를 떠돌며 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 살 때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했다. 아내는 썩 내키지 않았으나 자녀들을 출가까지 시켰으니 서울에 더 있을 이유도 없어 선도로 들어왔다.
현복순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꽃을 좋아했다. 친정인 목포 큰 기와집은 정원이 넓었고 덩굴장미며 천리향, 치자꽃이 사철 번갈아 피고 졌다. 꽃 속에서 자랐으니 꽃에 물들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선도에 돌아온 뒤 들판 한가운데 2314㎡의 땅에 덩그라니 작은 집 한 채를 지었다. 많은 땅이 남았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집 주위로 먼저 개나리를 심어서 울타리 삼았다. 수선화는 20여 년 전 진도의 어느 농장까지 찾아가 구근을 두 자루나 사다가 심었다. 할머니는 흰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수선화 중에서도 유독 흰 수선화 꽃을 많이 심었다.
할머니가 심은 수선화 구근 하나가 자라 선도의 온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할머니의 수선화 가꾸기 덕에 선도에서는 매년 봄에 수선화 축제가 열린다. 들판 곳곳에는 마늘, 대파 등과 함께 수선화가 가득 심어져 있다. 꽃 하나 가꾸는 것만으로도 섬이 환하게 달라졌다. 수선화 재배는 그냥 꽃만 보고 며칠 관광객이나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농사다. 수선화 구근은 번식이 아주 빠른 데다 농작물보다 비싼 값에 거래된다. 꽃도 보고 구근도 팔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주동 마을, 교회 앞에 수선화 할머니 댁 입구에는 ‘수선화의 집’이란 비석이 서 있다. 수선화의 집 정원은 온통 수선화 밭이다. 아흔이 넘은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도시에 있는 아들네로 거처를 옮겼다.
6.3㎢의 땅에 163가구 200명 정도 살아가는 선도는 신안군 지도읍에 속하지만, 육로는 무안군이 훨씬 가깝다. 신안군 가룡항에서 배로 35분 거리지만, 무안군 신월항에서는 10분 거리다. 한 때 면사무소가 있을 정도로 융성했다.
선도는 주동, 매계, 석산, 대촌, 북촌 등 5개 마을이 있다. 석산과 대촌은 붙어 있어서 하나의 마을로 치기도 한다. 섬은 대체로 평야와 낮은 언덕으로 이뤄져 편안한 느낌이다. 갯벌을 간척해서 만든 논밭이 드넓다. 그래서 과거 선도 주민들은 어업보다는 농업에 기대 살았다.
섬은 오랫동안 농경사회의 전통이 이어져 왔으니 인심 또한 넉넉하다. 처음 이사 온 이웃에게 식량 하라고 쌀 몇 가마니를 그냥 나눠주는 일도 흔하다. 마을공동체가 사라진 시대, 드물게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섬이다.
근래 들어 농사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자 비로소 어업으로 눈을 돌렸다. 낙지잡이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섬을 떠났던 출향인들이 하나둘 섬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2년 거주 후 일정액을 납부해야만 어촌계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낙지잡이를 할 수 있을 정도다. 갯벌이 쇠락해가던 섬을 살리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오랫동안 돌아보지도 않던 갯벌이 이제 선도 사람들의 생명줄이다.
선도 사람들은 맨손 낙지잡이도 하지만 대다수는 낚싯바늘을 연달아 매단 주낙(연승어업)으로 잡는다. 미끼는 주로 서렁게(칠게)를 쓰는데 예전에는 갯벌에서 직접 잡았지만 이제는 일손이 달려서 중국산을 쓴다. 낙지는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가리지 않고 먹이를 노리다 걸려든다. 주낙 낙지잡이는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조금 때가 적기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물이 너무 탁하거나 바닥에 파래가 자라기 시작해도 낙지잡이가 어렵다. 낙지는 주로 밤에 전깃불을 밝히고 잡는데 가장 잘 잡히는 때는 달이 밝을 때다. 이때를 달사리라 부르고, 이때 잡힌 낙지를 달사리 낙지라 한다. 고요한 밤바다 달빛 아래 낙지 잡는 풍경은 그야말로 꿈속인 듯 아련하다.
조선왕조의 공도 정책으로 섬 거주가 금지되다 다시 풀린 것은 임진왜란 전후다. 선도에도 이 무렵부터 주민 거주가 시작됐다. 선도는 밀양 박씨가 번성해서 한때 박씨도라 불렸을 정도다. 지금도 섬 주민의 절반이 밀양 박씨다. 그야말로 박씨 섬, 씨족 섬이라 할 만하다. 수많은 섬에서 집성촌을 목격했지만 이처럼 단일 성씨가 아직도 다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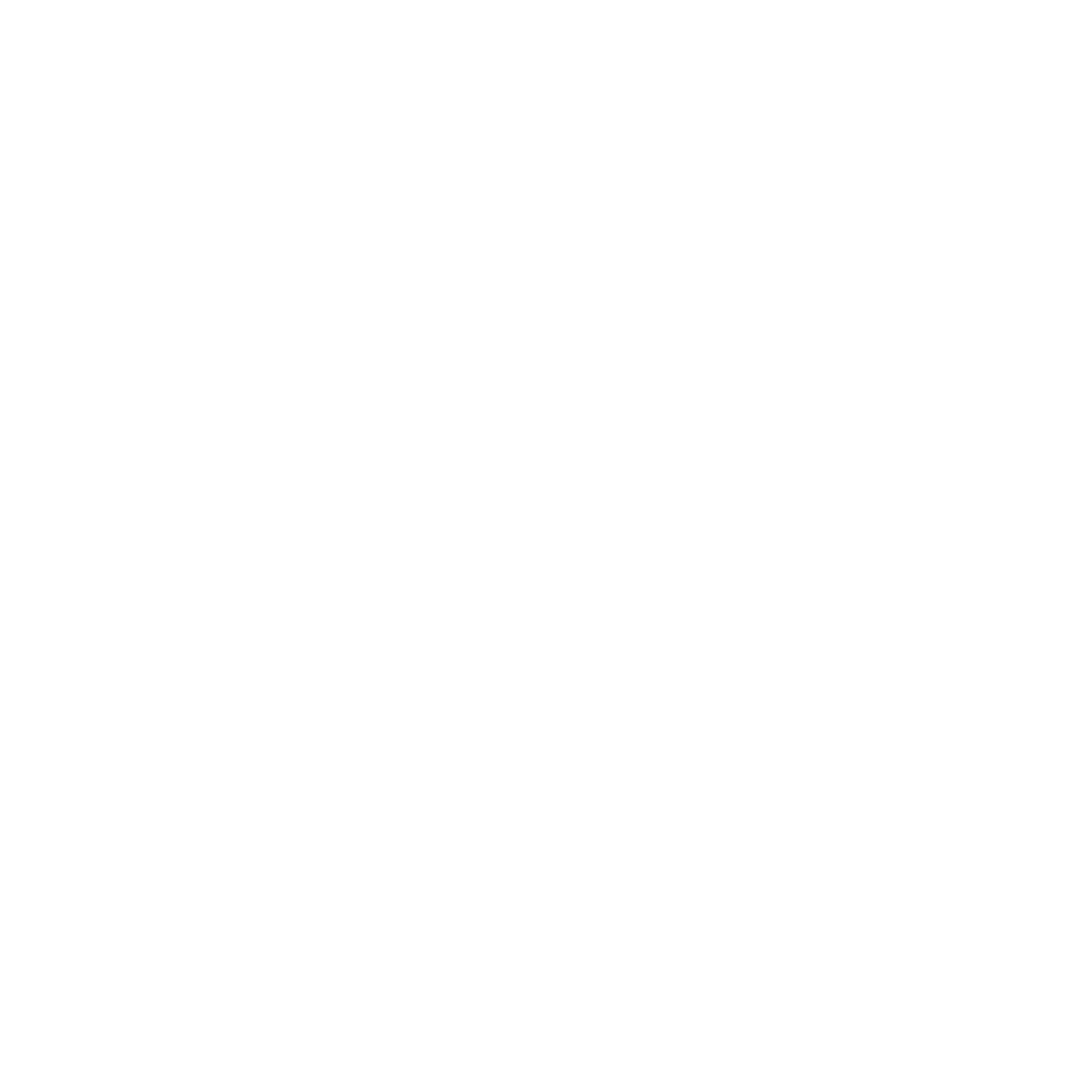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선도는 수선화 꽃섬이다. 4월 봄날, 수선화 꽃이 피면 섬 전체가 노랗게 물든다. 선도 수선화길은 수선화 꽃길과 대덕산 능선길을 이어 걷는 길이다. 선도항에서 출발해서 대덕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야트막해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발 밑에 펼쳐진 서해 바다 풍광이 아찔하다. 남쪽으로는 암태도와 자은도가, 북쪽으로는 저 멀리 영광 송이도까지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현지 실사단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라고 했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최근 선도는 수선화로 유명해졌다. 수선화 할머니로 불리는 현복순 할머니 덕이다.
할머니가 선도로 들어온 것은 삼십 몇 년 전이다. 선도는 남편의 고향이었다. 아내의 고향은 목포. 남편은 12년 전, 80세로 세상을 하직했다. 선도 최고 부잣집 아들이었던 남편은 고려대학을 졸업했고 아내는 목포에서 여고(여중여고통합과정)를 졸업했다. 아내도 ‘큰 기와집’이라 불리던 목포의 부잣집 둘째 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하지만 남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은 목포에서 교사를 했고 부산에서는 법원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객지를 떠돌며 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 살 때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했다. 아내는 썩 내키지 않았으나 자녀들을 출가까지 시켰으니 서울에 더 있을 이유도 없어 선도로 들어왔다.
현복순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꽃을 좋아했다. 친정인 목포 큰 기와집은 정원이 넓었고 덩굴장미며 천리향, 치자꽃이 사철 번갈아 피고 졌다. 꽃 속에서 자랐으니 꽃에 물들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선도에 돌아온 뒤 들판 한가운데 2314㎡의 땅에 덩그라니 작은 집 한 채를 지었다. 많은 땅이 남았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집 주위로 먼저 개나리를 심어서 울타리 삼았다. 수선화는 20여 년 전 진도의 어느 농장까지 찾아가 구근을 두 자루나 사다가 심었다. 할머니는 흰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수선화 중에서도 유독 흰 수선화 꽃을 많이 심었다.
할머니가 심은 수선화 구근 하나가 자라 선도의 온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할머니의 수선화 가꾸기 덕에 선도에서는 매년 봄에 수선화 축제가 열린다. 들판 곳곳에는 마늘, 대파 등과 함께 수선화가 가득 심어져 있다. 꽃 하나 가꾸는 것만으로도 섬이 환하게 달라졌다. 수선화 재배는 그냥 꽃만 보고 며칠 관광객이나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농사다. 수선화 구근은 번식이 아주 빠른 데다 농작물보다 비싼 값에 거래된다. 꽃도 보고 구근도 팔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주동 마을, 교회 앞에 수선화 할머니 댁 입구에는 ‘수선화의 집’이란 비석이 서 있다. 수선화의 집 정원은 온통 수선화 밭이다. 아흔이 넘은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도시에 있는 아들네로 거처를 옮겼다.
6.3㎢의 땅에 163가구 200명 정도 살아가는 선도는 신안군 지도읍에 속하지만, 육로는 무안군이 훨씬 가깝다. 신안군 가룡항에서 배로 35분 거리지만, 무안군 신월항에서는 10분 거리다. 한 때 면사무소가 있을 정도로 융성했다.
선도는 주동, 매계, 석산, 대촌, 북촌 등 5개 마을이 있다. 석산과 대촌은 붙어 있어서 하나의 마을로 치기도 한다. 섬은 대체로 평야와 낮은 언덕으로 이뤄져 편안한 느낌이다. 갯벌을 간척해서 만든 논밭이 드넓다. 그래서 과거 선도 주민들은 어업보다는 농업에 기대 살았다.
섬은 오랫동안 농경사회의 전통이 이어져 왔으니 인심 또한 넉넉하다. 처음 이사 온 이웃에게 식량 하라고 쌀 몇 가마니를 그냥 나눠주는 일도 흔하다. 마을공동체가 사라진 시대, 드물게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섬이다.
근래 들어 농사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자 비로소 어업으로 눈을 돌렸다. 낙지잡이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섬을 떠났던 출향인들이 하나둘 섬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2년 거주 후 일정액을 납부해야만 어촌계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낙지잡이를 할 수 있을 정도다. 갯벌이 쇠락해가던 섬을 살리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오랫동안 돌아보지도 않던 갯벌이 이제 선도 사람들의 생명줄이다.
선도 사람들은 맨손 낙지잡이도 하지만 대다수는 낚싯바늘을 연달아 매단 주낙(연승어업)으로 잡는다. 미끼는 주로 서렁게(칠게)를 쓰는데 예전에는 갯벌에서 직접 잡았지만 이제는 일손이 달려서 중국산을 쓴다. 낙지는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가리지 않고 먹이를 노리다 걸려든다. 주낙 낙지잡이는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조금 때가 적기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물이 너무 탁하거나 바닥에 파래가 자라기 시작해도 낙지잡이가 어렵다. 낙지는 주로 밤에 전깃불을 밝히고 잡는데 가장 잘 잡히는 때는 달이 밝을 때다. 이때를 달사리라 부르고, 이때 잡힌 낙지를 달사리 낙지라 한다. 고요한 밤바다 달빛 아래 낙지 잡는 풍경은 그야말로 꿈속인 듯 아련하다.
조선왕조의 공도 정책으로 섬 거주가 금지되다 다시 풀린 것은 임진왜란 전후다. 선도에도 이 무렵부터 주민 거주가 시작됐다. 선도는 밀양 박씨가 번성해서 한때 박씨도라 불렸을 정도다. 지금도 섬 주민의 절반이 밀양 박씨다. 그야말로 박씨 섬, 씨족 섬이라 할 만하다. 수많은 섬에서 집성촌을 목격했지만 이처럼 단일 성씨가 아직도 다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