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아도는 작은 섬이지만 걷다보면 국립공원의 큰 산들을 걷는 느낌을 줄 정도로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남봉에서 바라보는 오섬의 경치, 해안절경을 따라 걷는 길에서 만나는 웅장한 암릉과 바윗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보고 있으면 분명 서해지만 남해 어딘가에 와있는 느낌을 준다. 특히 남봉 정상 부근에서 만나는 능선은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연상시키고 코스 중간에는 작은 협곡을 만나기도 한다. 양쪽에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바위로 된 능선길을 걸으며 물 위를 떠서 걷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백아도를 추천한다.

백아도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다. 섬의 서북쪽에는 부대 마을이 있는데 예전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들은 이미 사라진 두 개의 기관 이름으로 불리지만 본래 부대마을은 큰 마을 학교마을은 작은 마을이었다. 학교나 부대 마을만큼이나 큰 마을, 작은 마을도 멋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기는 마을이라고는 달랑 두 개 뿐이니 달리 무슨 이름이 필요했겠는가. 지금은 부대마을보다 학교마을에 집이 몇 채 더 있어서 큰 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노인들만 15가구다.
학교마을 정자나무 그늘 아래 노인 두 분이 앉아 있다. 서로 말없이 바다만 바라본다. 조금 젊어 보이는 노인은 꽃게잡이 선주와 선장 등으로 외지를 떠돌다 근자에 고향인 백아도로 귀향했다. 백아도는 굴업도와 함께 민어와 꽃게 어장으로 한 때 성시를 이루기도 했었다. 아직도 섬에 꽃게 배가 있느냐 물으니 최근에 인천의 선주 한 사람이 100톤짜리 꽃게 배 한척을 가지고 들어와 정착했다 한다. 일종의 어업 이민인 셈이다. 그 외에는 소형 어선만 두 척.
“100톤이면 엄청 큰데, 그렇게 큰 배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커도 지고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지고 다녀죠?”
“들어서 올려만 주면 등에다 지고 다니지”
농담 속에서도 짙은 페이소스가 묻어 난다. 백아도, 울도 앞바다는 일제 때부터 유명한 새우 어장이었다. 그래서 덕적군도의 여느 섬들처럼 백아도 사람들도 옛날에는 새우젓을 담가두었다가 충남지방으로 나가 쌀을 바꿔다 먹고 살았다. 민어는 70년대 초까지 대량으로 잡혔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노인도 15톤 짜리 자망배로 민어 잡이를 했었다. 그때는 민어 그물에 걸린 꽃게를 떼어서 버리는 게 일이었다.
“그때는 민어울음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산에 앉아서 대화를 못할 정도였어. 꽉꽉거리는 게 매미 울음소리는 저리 가라야. 그렇게 버글 댔었는데. 지금은 씨가 말랐어.”
그 후에도 백아도 앞바다에서는 80년대 말까지 민어가 더러 나기는 했지만 숫자는 미미했다. 민어가 사라진 뒤에는 떼어서 내버리던 꽃게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섬에는 노인들만 남아 더 이상 힘든 어장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꽃게와 새우는 모두 외지 배들이 잡아간다. 섬에서는 소형어선 2척만 우럭, 놀래미, 장어 등을 통발로 잡고 자망 그물로 꽃게를 조금 잡을 뿐이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인천등지의 꽃게 배들이 백아도에 정박하고는 했었다. 노인들은 꽃게 그물 손질을 해주고 일당이라도 벌었다. 하지만 더 이상 꽃게 배들도 들어오지 않는다. 꽃게 그물이 유자망에서 닻자망으로 바뀌면서 노인들의 손으로는 더 이상 그물 손질을 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폐교가 된 학교는 학교마을 고개 넘어 풀숲에 묻혀 있다. 온갖 풀들이 자라나 학교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고개 마루에는 게을러 보이는 개 한 마리, 또 흑염소 한 마리가 묶여있다. 염소는 배가 부른지 풀을 뜯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먹이보다 낯선 길손에게 더 흥미를 보인다. ‘안녕’ 인사 한마디 건네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쪼르르 뒤쫓아 온다. 소심하고 겁이 많기로 유명한 염소가 낯선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녀석은 드물게 겁이 없거나 지독히도 외롭거나 그중 하나 일 테지. 자전거를 탄 청년 하나가 고갯길을 내려간다. 청년은 휴가나 방학 기간 고향에 온 것일까. 학교 앞 아담한 해변이 아늑하다. 늦은 오후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파도는 잘게 부서진다.
이 섬도 해안 도로를 내느라 산을 무자비하게 깎아버렸다. 곳곳에 잘려나간 바위산의 상처가 흉하다. 폭파시키려다 만 것인지 어떤 암반에는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 자동차가 거의 다닐 일 없는 이 작은 섬 길마저 저토록 넓은 시멘트 포장도로가 필요할까. 섬이든 산골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을 시비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찻길이 필요하면 이 섬의 규모에 맞게 아주 작은 도로를 내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동차가 3대 뿐인 섬에 이토록 넓은 도로가 필요한 까닭을 나그네는 납득할 수가 없다. 경제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는 가차 없이 폐교 시키는 정부가 자동차 3대를 위해 포장도로를 내주는 것은 대체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 주민들의 교통은 핑계에 불과하고 도로는 실상 토건업자들을 위한 것이겠지. 토건 공화국의 진면목을 목격한 것 같아 입맛이 쓰다. 섬의 끝과 끝은 걸어서도 30분이면 족하다. 길을 걷는 동안 나그네는 주민들의 차는 단 한척도 만나지 못했다. 공사차량만 한 대 마주쳤을 뿐이다. 쓸모 없는 포장 도로 낼 돈 수십억원(?)을 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는 섬의 큰 마을 이었으나 지금은 작은 마을이 된 부대마을 초입. 대숲에 둘러싸인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시선을 끈다. 혹시 선단여 바위가 된 오누이가 태어나고 자랐었던 집은 아닐까. 행랑채까지 있는 것을 보니 옛적에는 제법 섬의 유지 집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은 전체적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 폐가가 다 된 듯하다. 그래도 사립문 밖에 땔감이 잔뜩 쌓여 있고 마당에는 빨래가 걸려 있으니 아직 사람이 사는 것이 틀림없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할머니 한 분이 방안에 앉아 이른 저녁밥을 드시고 있다.
“실례합니다.”
“어디서 오셨소.”
“섬 구경 왔다가 들렀습니다.”
“다 벗고 있는디.”
할머니는 런닝셔츠 바람으로 계신 것이 민망하신지 수줍어하신다.
“어서 식사 하세요.”
할머니가 나오시려는 것을 말리고 집안을 둘러본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 손으로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물에 만 밥을 자신다.
“할머니, 집이 예쁘네요.”
“징글징글 하게 이뻐요. 비오면 새고, 하늘이 보이고. ”
할머니는 서러운 말씀도 고우시다.
“비만 오면 다른 집 가라고” 자식들한테 전화가 온다.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기왓장도 날리고 그런다. 지어진지 백년도 넘은 기울어 가는 낡은 집이지만 마당이고 부엌이고 어디 하나 어질러진 것 없이 단정하다. 마루 밑에는 구들이 있다. 아직도 겨울에는 나무를 때서 난방을 하신다. 부엌 아궁이에도 가마솥이 걸렸다. 가마솥 옆에는 가스렌지가 놓여있다. 부엌 수도 꼭지 아래는 물동이가 받처져 있다. 수도가 들어온 것은 몇 해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평생을 우물에서 물동이로 물을 길러다 먹었다. 수도가 들어 왔어도 버리지 못한 물동이는 할머니의 마음이기도 하다.
일흔 여덟, 할머니는 이 작은 섬 이 마을에 나서 평생을 살았다.
“이 마을에 생겨가 이 마을서 늙었어요. 여도 옛날에는 많이들 살았시다. 지금은 다들 죽고 나가고.”
할머니는 다 자신 밥상을 들고 나오신다.
“사람 늙으면 다리나 안 아팠으면 좋겠네. 아이고 힘들어.”
할아버지는 작은 배로 어로를 하다 돌아 가셨다.
“뗏마로, 낚시로 우럭새끼 그런 것 잡고 그렇게 살다 칠십도 못 잡수고 돌아가셨지.”
노인의 오빠들은 젊어서 연평바다에 조기잡이 갔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다. 친 오빠 둘과 사촌오빠 하나 그렇게 삼형제가 한 날 한시 한 바다에서 죽었다. 사나운 태풍 앞에서는 어머니인 바다도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머니가 사는 이 낡은 고택은 친정집이었다. 친정 조카들이 살다가 도시로 떠나고 난 뒤 오두막에 살던 할머니가 이주해 왔다. 비가 새는 낡은 집, 선풍기 한 대 없이 부채 하나로 타는 여름을 날지라도 할머니는 여기의 삶이 좋다.
“공기 좋고 여기가 좋지, 아프지만 않으면 좋은데 그게 걱정이야.”
다만 하나 고달픈 노동의 대가로 얻은 육신의 병만이 걱정이다. 어찌할 것인가. 할머니가 부엌에서 병을 들고 나와 시원한 물 한잔을 따라 주신다. 나그네는 벌컥벌컥 들이킨다. 자식 같으셨을까. 안쓰러웠던 것일까 할머니 말씀이 애틋하다.
“어째 시원한 물 한잔 주라고 말하지 않았소. 걸어 오니라 목이 탈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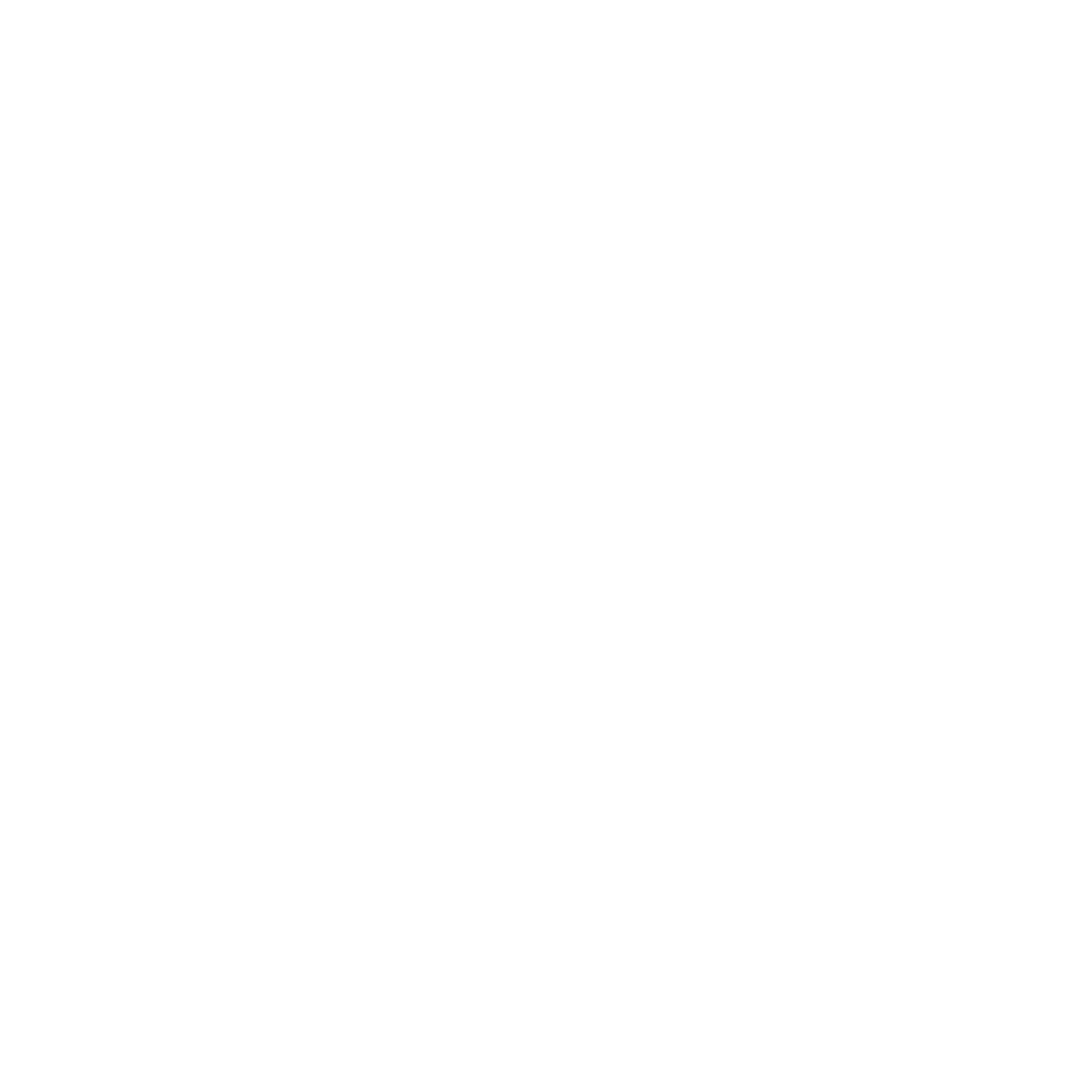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백아도는 작은 섬이지만 걷다보면 국립공원의 큰 산들을 걷는 느낌을 줄 정도로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남봉에서 바라보는 오섬의 경치, 해안절경을 따라 걷는 길에서 만나는 웅장한 암릉과 바윗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보고 있으면 분명 서해지만 남해 어딘가에 와있는 느낌을 준다. 특히 남봉 정상 부근에서 만나는 능선은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연상시키고 코스 중간에는 작은 협곡을 만나기도 한다. 양쪽에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바위로 된 능선길을 걸으며 물 위를 떠서 걷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백아도를 추천한다.
백아도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다. 섬의 서북쪽에는 부대 마을이 있는데 예전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들은 이미 사라진 두 개의 기관 이름으로 불리지만 본래 부대마을은 큰 마을 학교마을은 작은 마을이었다. 학교나 부대 마을만큼이나 큰 마을, 작은 마을도 멋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기는 마을이라고는 달랑 두 개 뿐이니 달리 무슨 이름이 필요했겠는가. 지금은 부대마을보다 학교마을에 집이 몇 채 더 있어서 큰 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노인들만 15가구다.
학교마을 정자나무 그늘 아래 노인 두 분이 앉아 있다. 서로 말없이 바다만 바라본다. 조금 젊어 보이는 노인은 꽃게잡이 선주와 선장 등으로 외지를 떠돌다 근자에 고향인 백아도로 귀향했다. 백아도는 굴업도와 함께 민어와 꽃게 어장으로 한 때 성시를 이루기도 했었다. 아직도 섬에 꽃게 배가 있느냐 물으니 최근에 인천의 선주 한 사람이 100톤짜리 꽃게 배 한척을 가지고 들어와 정착했다 한다. 일종의 어업 이민인 셈이다. 그 외에는 소형 어선만 두 척.
“100톤이면 엄청 큰데, 그렇게 큰 배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커도 지고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지고 다녀죠?”
“들어서 올려만 주면 등에다 지고 다니지”
농담 속에서도 짙은 페이소스가 묻어 난다. 백아도, 울도 앞바다는 일제 때부터 유명한 새우 어장이었다. 그래서 덕적군도의 여느 섬들처럼 백아도 사람들도 옛날에는 새우젓을 담가두었다가 충남지방으로 나가 쌀을 바꿔다 먹고 살았다. 민어는 70년대 초까지 대량으로 잡혔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노인도 15톤 짜리 자망배로 민어 잡이를 했었다. 그때는 민어 그물에 걸린 꽃게를 떼어서 버리는 게 일이었다.
“그때는 민어울음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산에 앉아서 대화를 못할 정도였어. 꽉꽉거리는 게 매미 울음소리는 저리 가라야. 그렇게 버글 댔었는데. 지금은 씨가 말랐어.”
그 후에도 백아도 앞바다에서는 80년대 말까지 민어가 더러 나기는 했지만 숫자는 미미했다. 민어가 사라진 뒤에는 떼어서 내버리던 꽃게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섬에는 노인들만 남아 더 이상 힘든 어장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꽃게와 새우는 모두 외지 배들이 잡아간다. 섬에서는 소형어선 2척만 우럭, 놀래미, 장어 등을 통발로 잡고 자망 그물로 꽃게를 조금 잡을 뿐이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인천등지의 꽃게 배들이 백아도에 정박하고는 했었다. 노인들은 꽃게 그물 손질을 해주고 일당이라도 벌었다. 하지만 더 이상 꽃게 배들도 들어오지 않는다. 꽃게 그물이 유자망에서 닻자망으로 바뀌면서 노인들의 손으로는 더 이상 그물 손질을 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폐교가 된 학교는 학교마을 고개 넘어 풀숲에 묻혀 있다. 온갖 풀들이 자라나 학교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고개 마루에는 게을러 보이는 개 한 마리, 또 흑염소 한 마리가 묶여있다. 염소는 배가 부른지 풀을 뜯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먹이보다 낯선 길손에게 더 흥미를 보인다. ‘안녕’ 인사 한마디 건네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쪼르르 뒤쫓아 온다. 소심하고 겁이 많기로 유명한 염소가 낯선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녀석은 드물게 겁이 없거나 지독히도 외롭거나 그중 하나 일 테지. 자전거를 탄 청년 하나가 고갯길을 내려간다. 청년은 휴가나 방학 기간 고향에 온 것일까. 학교 앞 아담한 해변이 아늑하다. 늦은 오후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파도는 잘게 부서진다.
이 섬도 해안 도로를 내느라 산을 무자비하게 깎아버렸다. 곳곳에 잘려나간 바위산의 상처가 흉하다. 폭파시키려다 만 것인지 어떤 암반에는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 자동차가 거의 다닐 일 없는 이 작은 섬 길마저 저토록 넓은 시멘트 포장도로가 필요할까. 섬이든 산골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을 시비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찻길이 필요하면 이 섬의 규모에 맞게 아주 작은 도로를 내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동차가 3대 뿐인 섬에 이토록 넓은 도로가 필요한 까닭을 나그네는 납득할 수가 없다. 경제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는 가차 없이 폐교 시키는 정부가 자동차 3대를 위해 포장도로를 내주는 것은 대체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 주민들의 교통은 핑계에 불과하고 도로는 실상 토건업자들을 위한 것이겠지. 토건 공화국의 진면목을 목격한 것 같아 입맛이 쓰다. 섬의 끝과 끝은 걸어서도 30분이면 족하다. 길을 걷는 동안 나그네는 주민들의 차는 단 한척도 만나지 못했다. 공사차량만 한 대 마주쳤을 뿐이다. 쓸모 없는 포장 도로 낼 돈 수십억원(?)을 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는 섬의 큰 마을 이었으나 지금은 작은 마을이 된 부대마을 초입. 대숲에 둘러싸인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시선을 끈다. 혹시 선단여 바위가 된 오누이가 태어나고 자랐었던 집은 아닐까. 행랑채까지 있는 것을 보니 옛적에는 제법 섬의 유지 집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은 전체적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 폐가가 다 된 듯하다. 그래도 사립문 밖에 땔감이 잔뜩 쌓여 있고 마당에는 빨래가 걸려 있으니 아직 사람이 사는 것이 틀림없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할머니 한 분이 방안에 앉아 이른 저녁밥을 드시고 있다.
“실례합니다.”
“어디서 오셨소.”
“섬 구경 왔다가 들렀습니다.”
“다 벗고 있는디.”
할머니는 런닝셔츠 바람으로 계신 것이 민망하신지 수줍어하신다.
“어서 식사 하세요.”
할머니가 나오시려는 것을 말리고 집안을 둘러본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 손으로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물에 만 밥을 자신다.
“할머니, 집이 예쁘네요.”
“징글징글 하게 이뻐요. 비오면 새고, 하늘이 보이고. ”
할머니는 서러운 말씀도 고우시다.
“비만 오면 다른 집 가라고” 자식들한테 전화가 온다.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기왓장도 날리고 그런다. 지어진지 백년도 넘은 기울어 가는 낡은 집이지만 마당이고 부엌이고 어디 하나 어질러진 것 없이 단정하다. 마루 밑에는 구들이 있다. 아직도 겨울에는 나무를 때서 난방을 하신다. 부엌 아궁이에도 가마솥이 걸렸다. 가마솥 옆에는 가스렌지가 놓여있다. 부엌 수도 꼭지 아래는 물동이가 받처져 있다. 수도가 들어온 것은 몇 해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평생을 우물에서 물동이로 물을 길러다 먹었다. 수도가 들어 왔어도 버리지 못한 물동이는 할머니의 마음이기도 하다.
일흔 여덟, 할머니는 이 작은 섬 이 마을에 나서 평생을 살았다.
“이 마을에 생겨가 이 마을서 늙었어요. 여도 옛날에는 많이들 살았시다. 지금은 다들 죽고 나가고.”
할머니는 다 자신 밥상을 들고 나오신다.
“사람 늙으면 다리나 안 아팠으면 좋겠네. 아이고 힘들어.”
할아버지는 작은 배로 어로를 하다 돌아 가셨다.
“뗏마로, 낚시로 우럭새끼 그런 것 잡고 그렇게 살다 칠십도 못 잡수고 돌아가셨지.”
노인의 오빠들은 젊어서 연평바다에 조기잡이 갔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다. 친 오빠 둘과 사촌오빠 하나 그렇게 삼형제가 한 날 한시 한 바다에서 죽었다. 사나운 태풍 앞에서는 어머니인 바다도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머니가 사는 이 낡은 고택은 친정집이었다. 친정 조카들이 살다가 도시로 떠나고 난 뒤 오두막에 살던 할머니가 이주해 왔다. 비가 새는 낡은 집, 선풍기 한 대 없이 부채 하나로 타는 여름을 날지라도 할머니는 여기의 삶이 좋다.
“공기 좋고 여기가 좋지, 아프지만 않으면 좋은데 그게 걱정이야.”
다만 하나 고달픈 노동의 대가로 얻은 육신의 병만이 걱정이다. 어찌할 것인가. 할머니가 부엌에서 병을 들고 나와 시원한 물 한잔을 따라 주신다. 나그네는 벌컥벌컥 들이킨다. 자식 같으셨을까. 안쓰러웠던 것일까 할머니 말씀이 애틋하다.
“어째 시원한 물 한잔 주라고 말하지 않았소. 걸어 오니라 목이 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