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도의 가장 높은 곳인 깃대봉 일대와 처녀바위, 당너머전망대에서는 주변 덕적군도의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을길과 해변길, 숲길 등 다양한 길들을 걸을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고���넉한 섬이 있었는지 섬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문갑해변을 비롯, 넓게 펼쳐진 여러 개의 해변은 섬의 한적함을 더한다. 아는 사람만 아는 섬으로 더 알려지기 전에 가봐야 할 섬이다.

노인은 말린 고추를 손질하고 있다.
“어디 안 아픈 디 없지. 너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해요. 올해 여든넷이요. 그냥 방에서 밥이나 먹고 들어앉아 있지.”
노인은 덕적도 도우 마을에서 문갑도로 시집 왔다. 열일곱에 낯선 섬으로 왔으니 문갑도에서만 67년을 살았다.
“애기가 시집 왔으니께 맨 날 울었지요. 저 덕적 섬만 보고 맨날 운거에요. 가는 배나 있���야 가지. 우리 시아버지가 조그만 이런 배를 부려요. 돛단배. 시아버지가 날 덕적에 실어다 줬어요. 시아버지가 날 그렇게 이뻐 했어요. 조선에 없는 며느리라고 귀여워했어요. 시집은 아들만 하나고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일가도 없고. 친정만 가면 내가 안 오니까. 안 올라고 울어 싸면 시아버지가 델꼬 오고.”
노인은 열일곱 그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으니 날마다 울면서 고향 덕적도만 그리워했다. 더러 친정으로 달아나기도 했지만 이내 친정 부모 손에 등 떠밀리고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다시 돌아와야 했다. 여든이 넘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곱다. 외아들에 고운 외며느리 얼마나 귀염을 많이 받았을까. 노인은 당최 아무 일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겸사를 하시지만 그 징하고 신산한 섬 살이를 다 헤쳐 오셨다.
“내가 근분 뭘 못해요. 그저 그냥 밥이나 해 묵고. 나무 해다 때고, 밭에서 보리 갈아서 거두고, 겨울 되면 갯 바탕에 굴 따고. 그것 밖에 암 것도 못해요.”
외동아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동갑이었다. 할아버지는 돛단배를 타고 연평도까지 조기잡이를 다녔고 문갑도 뒤쪽 바다에서 새우 잡이를 했다. 그 때만 해도 새우 잡아 새우 젖을 담갔고 섬은 풍요로웠다. 그렇게 건강히 일하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손써볼 틈도 없이 명을 다했다. 그때가 막 환갑이 됐을 때였다.
“지금으로 치면 암 병인가 봐요. 없이 사니께 병원을 갔나요 뭘. 아프니께 들어앉았다 돌아가셨제.”
할아버지는 암에 걸려 아무런 치료도 못 받아 보고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는 없이 살아 자식들 공부 못 시킨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섬에서 같이 사는 큰 딸은 예순넷. 아들은 오십도 못 되서 이승을 떠났다. 노인은 그래도 지금은 사는 것이 평안하다.
“옛날에 이거 사람 살 동넨가요. 아무 것도 해먹고 살 수 없는 동넨 걸요.”
같은 덕적군도의 섬이지만 문갑도는 덕적도나 소야도와는 달리 갯벌이 거의 없다. 뻘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적으니 섬살이가 더 팍팍하다. 새우잡이 어장으로 유명했던 문갑도. 어장에서 새우가 사라지자 어선들도 모두 떠나갔다. 다른 섬들과 달리 젊은 사람이 들어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섬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노인들만 40여 가구. 하지만 작은 섬에 교회는 셋이나 된다.
마을 안길로 들어서니 섬은 전형적인 농촌이다. 메밀은 이제 막 꽃이 피었으나 고구마는 캘 때가 다 됐고 수수도 여물었다. 마을은 병풍처럼 둘러선 산자락 아래 포근히 안겨 있다. 마을의 맨 끝 언덕에 교회 하나가 서 있다. 낡은 교회 뒤 수수 밭에서 노인 둘이 밭일을 하고 있다. 부부일까. 할아버지는 수수를 베고 할머니는 수수대에서 알곡이 달린 마디를 잘라낸다.
“수수를 많이 심으셨네요.”
“많이 심었어도 소용없어요. 비둘기, 까치가 다 먹어 버리고.”
할아버지가 밭주인이고 할머니는 일을 거들러 온 동네 사람이다. 노인은 식량도 하고 팔기도 하려고 수수를 심었다. 올해 수수는 작황이 좋지 않다. 수수를 베던 노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쉬신다. 간만에 섬을 찾아온 나그네를 반기는 눈치다. 노인은 올해 칠십이지만 허리가 꼿꼿하고 활력이 넘친다. 언뜻 봐서는 오십대처럼 보인다.
“작년만 해도 예순이 안 된 걸로 보더니 신경을 많이 쓰니까 갑자기 늙어 버리더라구요. 올해 팍싹 늙었어요.”
노인의 아내는 몸이 마비 되서 2년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 노인의 외모가 범상치 않다. 양쪽 귀에는 귀걸이를 했다.
“멋쟁이시네요. 귀걸이도 하시고.”
“이쁘라고 뚫은 거 아니야. 골이 하도 아퍼서 귀를 뚫었지. 펜잘을 삼시 세 때 먹어댔는데 귀 뚫고는 안 아파요.”
노인은 두통 때문에 귀를 뚫었다지만 귀걸이가 썩 잘 어울린다.
“챙피할 때는 챙피해도 내가 안 아프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은 부작용 생길까봐 금이나 은으로만 한다는데 나는 아무거나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노인은 수수만큼이나 메밀도 많이 심었다. 메밀밭이 소금 뿌려 놓은 듯 하얗다. 잡곡은 노인의 식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울, 인천 사람들이 사간다.
“당뇨 있는 사람이 잡곡 부탁하면 안 줄 수 없잖아. 사는 게 다 그렇시다.”
노인은 밭 옆의 작은 샘에서 물을 떠 마신다.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아직껏 살아 있는 샘을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섬은 옛날부터 물 사정이 좋았다.
“섬 치고는 물이 최고로 맛있어. 물이 흔해. 옛날부터 식수 곤란은 안 봐. 딴 섬은 가물면 물을 실어다 배급도 주고 그랬거든. 여기는 암만 가물어도 물이 고정적으로 나와.”
노인은 섬에서 살았어도 뱃일을 모르고 살았다. 평생 농사만 지었다.
“배는 암 것도 몰라. 수영도 못해. 어려서부터 밭에서 일만 해놔서 수영을 못해. 옛날에는 여게도 배가 많았더랬는데. 지금은 없어.”
노인은 새우젓배로 성시를 이루던 섬을 기억한다. 새우젓배가 사라진지 벌써 30여년.
“새우젓 날 때는 여가 부자 동네였어. 오죽하면 바닷가에 갔다가 대변 보고 닦을 것 없으면 종이돈으로 휴지 했을라고. 그 때는 인심도 좋아서 장사꾼들이 들어오면 공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어. 지금은 인심이 나빠졌어. 교회들이 여럿 생기면서 인심이 바뀌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교회로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다투면서 작은 마을이 분열 됐다. 개신 교회 둘, 천주교 공소 하나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40가구 사는 작은 마을이 네 패로 나누어지면서 마을 공동체는 와해돼 버렸다. 서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앞에 사람 줄 것 있으면 교회 갔다주기 때문에 옆 사람 안 줘.”
노인과 이야기 나누는 사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더 와서 수수 밭 일을 거든다. 너무 오래 일을 방해 한 것 같아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하니 노인이 흔쾌히 허락 한다. 노인의 품이 멋있다.
“젊어서는 한 가락 하셨겠어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뗀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한가락 하고 살긴 살았지.”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잇는다. 노인도 어려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이십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믿었냐 하면.”
지금은 무인도가 된 저 건너 선갑도에 스님 한분이 암자를 짓고 살았었다. 노인은 아홉 살 때 스님의 절로 보내졌다. 거기서 6년을 살았다. 동자승 생활을 하며 맨날 불공을 드렸지만 부처님 보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15살 때 다시 문갑도로 왔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때 섬에 처음 교회가 생겼고 나도 교회에 댕기기 시작했지. 그러다 늦게 군대를 갔어. 27살 먹어서 갔으니까.”
군대에 가서는 연대장 당번병을 하며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이년 동안이나 이유 없이 아팠다. 제대를 하고 나서도 역시 이유 없이 또 삼년을 아팠다.
노인의 병은 무병이었다.
“나도 모르게 아픈 거여. 꿈에 꼭 옛날 할아버지가 보이고. 뚜렷하게 보여.”
꿈이 아니라도 낮에도 눈만 살짝 감았다 하면 갓 쓴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 사람들마다 다 죽을 거라고 했다. 외할아버지가 덕적도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이모도 독실한 교인인데 무당집으로 손을 끌고 갔다. 무당은 옛날 할아버지 조상님이 찾아오는 거라 했다. 믿기지 않아서 인천으로 갔다. 인천의 무당집 열 곳을 돌아 다녔다. 다 똑같은 소릴 했다. 인천에서 제일 큰 만신을 찾아갔다. 처음 만난 덕적도 무당에게 신 내림 굿을 받으라 했다. 덕적도 서포리의 무당 할머니를 모셔다 굿을 했다. 굿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
내림굿을 받았지만 무당이 된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죽어라 일을 했다. 신 받은 것을 묻어둔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자다가도 모를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 일을 쑥쑥 내뱉는데 그게 다 맞았다. 그 길로 다시 인천으로 갔다. 큰 무당집을 찾아가 얻어먹고 굿 수발을 하며 3개월을 살았다. 신어머니와 신아들이 되었다. 신어머니는 굿을 하다가 한 거리씩 하라고 나누어 주며 노인을 키웠다. 그 후 신어머니와는 20년 넘게 인천과 문갑도를 왕래 하며 살았다. 신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인천의 굿당과 문갑도를 오가며 만신으로 살았다.
“작두를 타고 굿을 크게 해. 내가 큰 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숨기려니 힘들어. 처음에는 조상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산신령, 별별 신들이 다 들어와. 일월성신이 들어오고 옥황상제도 들어오고, 각 나라 장군들도 들어오고. 신들이 들어올 때 호명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름을 알지.”
노인은 김현기(71세) 만신, 문갑도 무교(巫敎)의 마지막 사제다. 지금도 굿을 할 때면 마을 경로당 앞에서 작두를 탄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도 친하게 지낸다. 수수밭 일을 도우러온 할머니 두 분도 교회에 다닌다. 교인들이 서로 다른 교회 교인들과는 척을 지고 살면서도 무당인 노인과는 꺼리낌이 없다.
“내가 믿음 가지고 다투지 말자 그래.”
처음에는 무당이 된 것을 탄식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복으로 여긴다.
“천지신명이 나를 점지 했잖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찍은 것만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인천의 굿당에 가서 무당들을 거느리고 큰 굿을 주관하곤 했다. 지금은 섬에만 살면서 개도 기르고 돼지도 키우고, 고구마, 수수, 메밀 농사지으며 산다.
노인의 굿당은 당산 아래 있다. 문갑도의 올림푸스산, 당산은 여전히 신성하다.
“산신령님이 지호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섬사람들 누구도 선뜻 들어가지 못한다. 만신인 노인만 제를 지내러 들어간다. 예전에는 마을 당산제가 제법 컸었다. 해마다 마을에서 기르는 소를 통째로 잡아서 바쳤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사라져 갔다. 요즈음에는 노인 혼자 겨울에 길일을 받아 제를 지낸다. 소를 잡을 수 없으니 인천에서 쇠고기를 사다가 바친다.
“나는 쌈을 해도 절대 악담을 안 해. 내가 악담을 하면 그 사람한테 안 좋거든. 내 몸 안에 만 신명을 모셨으니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만 마디 하는 거야. 그러니 안 좋지. 아무튼 누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면 못써. 악담을 하면 자기부터 악담을 맞는다 그랬잖아.”
나그네는 노인을 따라 굿당으로 간다. 굿당 안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을 모셔져 있다. 본산 신령님, 임경업 장군신, 눈만 감으며 보이던 삿갓 쓴 할아버지. 강릉 김씨 입도조 할아버지. 장씨 할머니. 옥황상제, 일월성신, 성수 장군. 일월 도신장. 칠석님, 팔선녀. 백마여장군까지 신전의 신들은 날마다 노인의 치성을 받는다. 노인은 굿을 할 때면 타는 작두를 꺼내 보여준다. 신 내림 받을 때부터 수 십 년을 탔다는 작두지만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다.
“나도 인간이잖아. 그냥 있을 때 작두날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 하지만 신명이 오르면 아무렇지도 않아.”
나그네는 굿당의 신령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굿당을 나선다. 절에 가서 보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지만 어떤 신도 배척할 생각이 없다. 노인은 떠나는 나그네를 배웅하며 혼자 말처럼 한마디 하신다. 맺혔던 응어리가 터지는 소리.
“저 신령님들이 마귀가 아녀. 다들 우리 조상님들이지. 마귀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답답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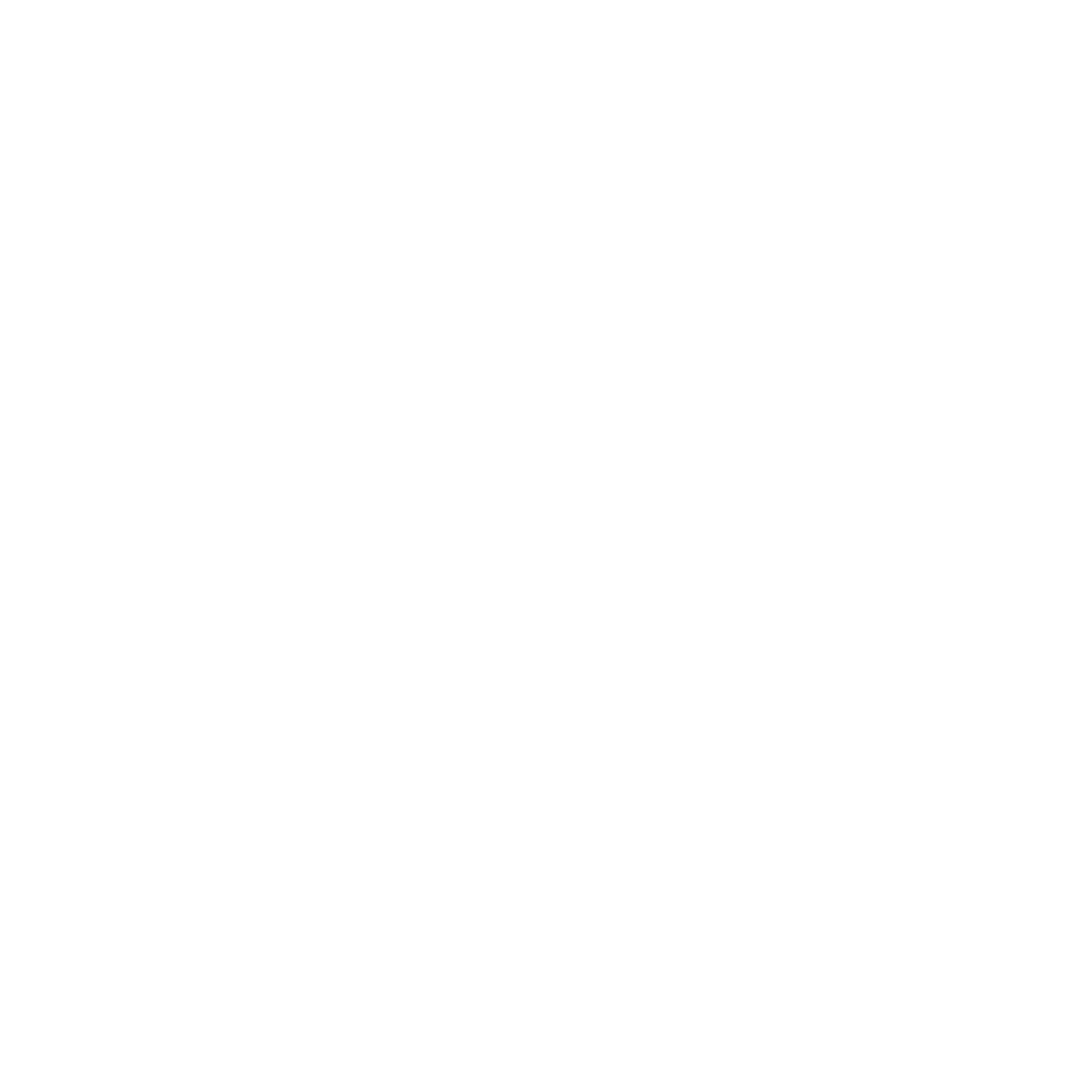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문갑도의 가장 높은 곳인 깃대봉 일대와 처녀바위, 당너머전망대에서는 주변 덕적군도의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을길과 해변길, 숲길 등 다양한 길들을 걸을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고���넉한 섬이 있었는지 섬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문갑해변을 비롯, 넓게 펼쳐진 여러 개의 해변은 섬의 한적함을 더한다. 아는 사람만 아는 섬으로 더 알려지기 전에 가봐야 할 섬이다.
노인은 말린 고추를 손질하고 있다.
“어디 안 아픈 디 없지. 너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해요. 올해 여든넷이요. 그냥 방에서 밥이나 먹고 들어앉아 있지.”
노인은 덕적도 도우 마을에서 문갑도로 시집 왔다. 열일곱에 낯선 섬으로 왔으니 문갑도에서만 67년을 살았다.
“애기가 시집 왔으니께 맨 날 울었지요. 저 덕적 섬만 보고 맨날 운거에요. 가는 배나 있���야 가지. 우리 시아버지가 조그만 이런 배를 부려요. 돛단배. 시아버지가 날 덕적에 실어다 줬어요. 시아버지가 날 그렇게 이뻐 했어요. 조선에 없는 며느리라고 귀여워했어요. 시집은 아들만 하나고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일가도 없고. 친정만 가면 내가 안 오니까. 안 올라고 울어 싸면 시아버지가 델꼬 오고.”
노인은 열일곱 그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으니 날마다 울면서 고향 덕적도만 그리워했다. 더러 친정으로 달아나기도 했지만 이내 친정 부모 손에 등 떠밀리고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다시 돌아와야 했다. 여든이 넘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곱다. 외아들에 고운 외며느리 얼마나 귀염을 많이 받았을까. 노인은 당최 아무 일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겸사를 하시지만 그 징하고 신산한 섬 살이를 다 헤쳐 오셨다.
“내가 근분 뭘 못해요. 그저 그냥 밥이나 해 묵고. 나무 해다 때고, 밭에서 보리 갈아서 거두고, 겨울 되면 갯 바탕에 굴 따고. 그것 밖에 암 것도 못해요.”
외동아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동갑이었다. 할아버지는 돛단배를 타고 연평도까지 조기잡이를 다녔고 문갑도 뒤쪽 바다에서 새우 잡이를 했다. 그 때만 해도 새우 잡아 새우 젖을 담갔고 섬은 풍요로웠다. 그렇게 건강히 일하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손써볼 틈도 없이 명을 다했다. 그때가 막 환갑이 됐을 때였다.
“지금으로 치면 암 병인가 봐요. 없이 사니께 병원을 갔나요 뭘. 아프니께 들어앉았다 돌아가셨제.”
할아버지는 암에 걸려 아무런 치료도 못 받아 보고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는 없이 살아 자식들 공부 못 시킨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섬에서 같이 사는 큰 딸은 예순넷. 아들은 오십도 못 되서 이승을 떠났다. 노인은 그래도 지금은 사는 것이 평안하다.
“옛날에 이거 사람 살 동넨가요. 아무 것도 해먹고 살 수 없는 동넨 걸요.”
같은 덕적군도의 섬이지만 문갑도는 덕적도나 소야도와는 달리 갯벌이 거의 없다. 뻘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적으니 섬살이가 더 팍팍하다. 새우잡이 어장으로 유명했던 문갑도. 어장에서 새우가 사라지자 어선들도 모두 떠나갔다. 다른 섬들과 달리 젊은 사람이 들어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섬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노인들만 40여 가구. 하지만 작은 섬에 교회는 셋이나 된다.
마을 안길로 들어서니 섬은 전형적인 농촌이다. 메밀은 이제 막 꽃이 피었으나 고구마는 캘 때가 다 됐고 수수도 여물었다. 마을은 병풍처럼 둘러선 산자락 아래 포근히 안겨 있다. 마을의 맨 끝 언덕에 교회 하나가 서 있다. 낡은 교회 뒤 수수 밭에서 노인 둘이 밭일을 하고 있다. 부부일까. 할아버지는 수수를 베고 할머니는 수수대에서 알곡이 달린 마디를 잘라낸다.
“수수를 많이 심으셨네요.”
“많이 심었어도 소용없어요. 비둘기, 까치가 다 먹어 버리고.”
할아버지가 밭주인이고 할머니는 일을 거들러 온 동네 사람이다. 노인은 식량도 하고 팔기도 하려고 수수를 심었다. 올해 수수는 작황이 좋지 않다. 수수를 베던 노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쉬신다. 간만에 섬을 찾아온 나그네를 반기는 눈치다. 노인은 올해 칠십이지만 허리가 꼿꼿하고 활력이 넘친다. 언뜻 봐서는 오십대처럼 보인다.
“작년만 해도 예순이 안 된 걸로 보더니 신경을 많이 쓰니까 갑자기 늙어 버리더라구요. 올해 팍싹 늙었어요.”
노인의 아내는 몸이 마비 되서 2년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 노인의 외모가 범상치 않다. 양쪽 귀에는 귀걸이를 했다.
“멋쟁이시네요. 귀걸이도 하시고.”
“이쁘라고 뚫은 거 아니야. 골이 하도 아퍼서 귀를 뚫었지. 펜잘을 삼시 세 때 먹어댔는데 귀 뚫고는 안 아파요.”
노인은 두통 때문에 귀를 뚫었다지만 귀걸이가 썩 잘 어울린다.
“챙피할 때는 챙피해도 내가 안 아프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은 부작용 생길까봐 금이나 은으로만 한다는데 나는 아무거나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노인은 수수만큼이나 메밀도 많이 심었다. 메밀밭이 소금 뿌려 놓은 듯 하얗다. 잡곡은 노인의 식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울, 인천 사람들이 사간다.
“당뇨 있는 사람이 잡곡 부탁하면 안 줄 수 없잖아. 사는 게 다 그렇시다.”
노인은 밭 옆의 작은 샘에서 물을 떠 마신다.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아직껏 살아 있는 샘을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섬은 옛날부터 물 사정이 좋았다.
“섬 치고는 물이 최고로 맛있어. 물이 흔해. 옛날부터 식수 곤란은 안 봐. 딴 섬은 가물면 물을 실어다 배급도 주고 그랬거든. 여기는 암만 가물어도 물이 고정적으로 나와.”
노인은 섬에서 살았어도 뱃일을 모르고 살았다. 평생 농사만 지었다.
“배는 암 것도 몰라. 수영도 못해. 어려서부터 밭에서 일만 해놔서 수영을 못해. 옛날에는 여게도 배가 많았더랬는데. 지금은 없어.”
노인은 새우젓배로 성시를 이루던 섬을 기억한다. 새우젓배가 사라진지 벌써 30여년.
“새우젓 날 때는 여가 부자 동네였어. 오죽하면 바닷가에 갔다가 대변 보고 닦을 것 없으면 종이돈으로 휴지 했을라고. 그 때는 인심도 좋아서 장사꾼들이 들어오면 공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어. 지금은 인심이 나빠졌어. 교회들이 여럿 생기면서 인심이 바뀌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교회로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다투면서 작은 마을이 분열 됐다. 개신 교회 둘, 천주교 공소 하나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40가구 사는 작은 마을이 네 패로 나누어지면서 마을 공동체는 와해돼 버렸다. 서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앞에 사람 줄 것 있으면 교회 갔다주기 때문에 옆 사람 안 줘.”
노인과 이야기 나누는 사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더 와서 수수 밭 일을 거든다. 너무 오래 일을 방해 한 것 같아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하니 노인이 흔쾌히 허락 한다. 노인의 품이 멋있다.
“젊어서는 한 가락 하셨겠어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뗀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한가락 하고 살긴 살았지.”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잇는다. 노인도 어려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이십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믿었냐 하면.”
지금은 무인도가 된 저 건너 선갑도에 스님 한분이 암자를 짓고 살았었다. 노인은 아홉 살 때 스님의 절로 보내졌다. 거기서 6년을 살았다. 동자승 생활을 하며 맨날 불공을 드렸지만 부처님 보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15살 때 다시 문갑도로 왔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때 섬에 처음 교회가 생겼고 나도 교회에 댕기기 시작했지. 그러다 늦게 군대를 갔어. 27살 먹어서 갔으니까.”
군대에 가서는 연대장 당번병을 하며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이년 동안이나 이유 없이 아팠다. 제대를 하고 나서도 역시 이유 없이 또 삼년을 아팠다.
노인의 병은 무병이었다.
“나도 모르게 아픈 거여. 꿈에 꼭 옛날 할아버지가 보이고. 뚜렷하게 보여.”
꿈이 아니라도 낮에도 눈만 살짝 감았다 하면 갓 쓴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 사람들마다 다 죽을 거라고 했다. 외할아버지가 덕적도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이모도 독실한 교인인데 무당집으로 손을 끌고 갔다. 무당은 옛날 할아버지 조상님이 찾아오는 거라 했다. 믿기지 않아서 인천으로 갔다. 인천의 무당집 열 곳을 돌아 다녔다. 다 똑같은 소릴 했다. 인천에서 제일 큰 만신을 찾아갔다. 처음 만난 덕적도 무당에게 신 내림 굿을 받으라 했다. 덕적도 서포리의 무당 할머니를 모셔다 굿을 했다. 굿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
내림굿을 받았지만 무당이 된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죽어라 일을 했다. 신 받은 것을 묻어둔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자다가도 모를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 일을 쑥쑥 내뱉는데 그게 다 맞았다. 그 길로 다시 인천으로 갔다. 큰 무당집을 찾아가 얻어먹고 굿 수발을 하며 3개월을 살았다. 신어머니와 신아들이 되었다. 신어머니는 굿을 하다가 한 거리씩 하라고 나누어 주며 노인을 키웠다. 그 후 신어머니와는 20년 넘게 인천과 문갑도를 왕래 하며 살았다. 신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인천의 굿당과 문갑도를 오가며 만신으로 살았다.
“작두를 타고 굿을 크게 해. 내가 큰 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숨기려니 힘들어. 처음에는 조상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산신령, 별별 신들이 다 들어와. 일월성신이 들어오고 옥황상제도 들어오고, 각 나라 장군들도 들어오고. 신들이 들어올 때 호명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름을 알지.”
노인은 김현기(71세) 만신, 문갑도 무교(巫敎)의 마지막 사제다. 지금도 굿을 할 때면 마을 경로당 앞에서 작두를 탄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도 친하게 지낸다. 수수밭 일을 도우러온 할머니 두 분도 교회에 다닌다. 교인들이 서로 다른 교회 교인들과는 척을 지고 살면서도 무당인 노인과는 꺼리낌이 없다.
“내가 믿음 가지고 다투지 말자 그래.”
처음에는 무당이 된 것을 탄식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복으로 여긴다.
“천지신명이 나를 점지 했잖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찍은 것만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인천의 굿당에 가서 무당들을 거느리고 큰 굿을 주관하곤 했다. 지금은 섬에만 살면서 개도 기르고 돼지도 키우고, 고구마, 수수, 메밀 농사지으며 산다.
노인의 굿당은 당산 아래 있다. 문갑도의 올림푸스산, 당산은 여전히 신성하다.
“산신령님이 지호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섬사람들 누구도 선뜻 들어가지 못한다. 만신인 노인만 제를 지내러 들어간다. 예전에는 마을 당산제가 제법 컸었다. 해마다 마을에서 기르는 소를 통째로 잡아서 바쳤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사라져 갔다. 요즈음에는 노인 혼자 겨울에 길일을 받아 제를 지낸다. 소를 잡을 수 없으니 인천에서 쇠고기를 사다가 바친다.
“나는 쌈을 해도 절대 악담을 안 해. 내가 악담을 하면 그 사람한테 안 좋거든. 내 몸 안에 만 신명을 모셨으니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만 마디 하는 거야. 그러니 안 좋지. 아무튼 누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면 못써. 악담을 하면 자기부터 악담을 맞는다 그랬잖아.”
나그네는 노인을 따라 굿당으로 간다. 굿당 안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을 모셔져 있다. 본산 신령님, 임경업 장군신, 눈만 감으며 보이던 삿갓 쓴 할아버지. 강릉 김씨 입도조 할아버지. 장씨 할머니. 옥황상제, 일월성신, 성수 장군. 일월 도신장. 칠석님, 팔선녀. 백마여장군까지 신전의 신들은 날마다 노인의 치성을 받는다. 노인은 굿을 할 때면 타는 작두를 꺼내 보여준다. 신 내림 받을 때부터 수 십 년을 탔다는 작두지만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다.
“나도 인간이잖아. 그냥 있을 때 작두날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 하지만 신명이 오르면 아무렇지도 않아.”
나그네는 굿당의 신령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굿당을 나선다. 절에 가서 보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지만 어떤 신도 배척할 생각이 없다. 노인은 떠나는 나그네를 배웅하며 혼자 말처럼 한마디 하신다. 맺혔던 응어리가 터지는 소리.
“저 신령님들이 마귀가 아녀. 다들 우리 조상님들이지. 마귀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답답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