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 마라도 둘레길은 마라도항에서 시작하여 국토최남단비까지 진행 방향이 서쪽이든 동쪽이든 섬을 한 바퀴 순환하는 길이다. 가파도만큼이나 낮고 평평해 느긋한 걸음으로 1시간 정도면 섬을 한 바퀴 걸을 수 있다. 사방팔방 확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광활한 들판 위를 걷는 느낌이다.

마라도에는 그 상징성 때문에 3대 종단의 신전이 다 들어서 있다. 불교의 사찰과 천주교 성당, 개신교 교회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들 종교시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정작 오랜 세월 마라도를 지켜온 토착신의 신전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토착신의 신전은 번듯한 건물 하나 없기 때문이다. 이 신전은 마라도 들머리 오른쪽 해변에 있는 애기업개 당이다. 제주는 신들의 왕국이다. 무려 1만8천의 신들이 거처한다. 마을마다 마을신들이 따로 있다. 마라도의 신은 애기업개다. 마라도에 가거든 잊지 말고 애기업개당을 찾아가시라. 거기 섬의 신화와 역사가 다 들어 있다. 애기업개는 오랜 세월 섬의 수호신이었다. 살아서 처참했으나 죽어서 신이 된 여자 아이.
옛날 가파도와 마라도에 사람이 살지 않던 시절, 모슬포 사는 이씨 여인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여인은 관에 신고했으나 부모를 찾지 못했고 아이는 여인에게 맡겨졌다. 아이가 없던 여인은 딸처럼 길렀다. 아이가 여덟 살 되던 해 여인은 아이를 낳았다. 주어다 기른 아이는 애기업개가 되었다. 애기업개는 구성진 소리를 잘도 했다. 갓난아이가 울 때면 애기업개는 아이를 업고 얼르며 자장가를 불러 주었다.
“아가 아가 우지마라. 아방 있고 어멍 있는 아가 너 왜 우느냐.”
애기업개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달랬다. 그 무렵 마라도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禁)섬이었다. 섬 주변에 해산물이 넘쳐나도 물살이 거세 좀처럼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매년 봄 망종 때부터 보름간은 물살이 없어 입도(入島)가 허가 되었다. 어느 봄 모슬포의 ‘잠수’들이 테우를 타고 마라도로 들어갔다. 테우 주인인 이씨 부부는 아이와 열 세 살이 된 애기업개를 함께 데리고 섬으로 갔다. 잠수들은 지천으로 널린 해산물을 손쉽게 건저 올렸다. 식량이 다 떨어질 즈음 잠수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테우가 섬을 벗어나려 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다. 떠날 것을 포기하고 섬으로 돌아오니 바람은 잠잠해 졌다. 다시 떠나려면 또 바람이 거세졌다. 그러기를 여러 날 반복됐다. 잡아놓은 해산물까지 다 먹고 없어졌다. 물과 양식이 아주 바닥나 버린 날 저녁 잠수들은 기어코 내일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가장 연장자인 잠수가 꿈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꿈에 애기업개를 두고 가지 않으면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고 했다. 테우의 주인 이씨 부인 또한 같은 꿈을 꾸었다. 잠수들은 애기업개를 놓고 가기로 결정했다. 이씨 부인은 기저귀 하나를 걸어놓았다. 테우에 사람들이 오르자 다시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씨 부인은 애기업개에게 기저귀를 걷어오도록 시켰다.
애기업개가 기저귀를 가지러 간 사이 테우는 떠나갔다. 애기업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테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 3년 동안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마라도에 가지 못했다. 3년 후 사람들이 다시 마라도에 들어갔을 때 애기업개는 백골이 되어 있었다. 잠수들은 뼈를 거두어 묻었다. 후일 마라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한 노인의 꿈에 자꾸 애기업개가 나타났다. 섬사람들은 애기업개가 죽은 자리에 당을 만들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애기업개당은 처녀당, 할망당이라고도 한다. 커보지도 못하고, 늙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가 처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다. 섬의 수호신으로 자라난 것이다. 애기업개당은 1995년 무렵 한차례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어떤 기독교인이 미신이라는 이유로 당을 망가뜨렸다. 제주 어느 곳처럼 마라도에도 집 근처에 무덤이 있다. 제주만이 아니다. 섬에서는 대문 밖에다 무덤을 쓰는 일도 흔 하다. 무덤은 밭 가운데도 있고 뒷마당에도 있다.
땅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섬사람들이 죽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섬사람이 본래 무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섬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일상인 까닭이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박한 것이다. 생사불이(生死不二)를 늘 목전에서 보고 사는 삶.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밭이기도 한 바다가 언제든 죽음의 수렁이 될 수도 있다. 바다가, 바람이, 풍랑이 섬사람들로 하여금 생사불이의 화두를 깨치게 한 것이다.
국토 최남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마라도는 독도와 함께 가장 유명한 한국의 섬 중 하나다. 마라도는 가파도 만큼이나 평평하다. 산은 커녕 구릉조차 없다. 마라도에는 제대로 된 숲도 없다. 인공조림으로 소나무들을 조금 심었으나 바람 때문에 성장이 더디다. 본래부터 마라도가 민둥한 땅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살기 전 마라도는 원시림으로 덮인 울창한 숲이었다.
공도와 해금령이 풀리고 마라도에 사람들이 다시 이주해 살기 시작한 것은 1883년 무렵이었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어떤 사람이 살길을 찾아 탄원을 한 끝에 허락을 받아냈다. 처음 섬에 들어온 도박꾼과 일행이 몇 뙈기 밭을 일구기 위해 수 천 년 원시림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마라도의 모든 것을 태우는데 석 달 열흘이 걸렸다는 전설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천년 세월이 불타는데 석 달이 길다 하겠는가.
나무를 다 없애버렸으니 섬에는 땔감이 없었다. 그래서 연료를 얻을 목적으로 소를 길렀다. 유목민들처럼 소똥을 주어다 넓적하게 빚어 돌담이나 잔디밭에 널어 말린 뒤 땔감으로 썼다. 전기가 없고 등잔 기름이 없던 시절에는 빅게(수염상어)와 도롱이(불범상어)를 잡아 내장을 끓인 뒤 기름을 만들어 불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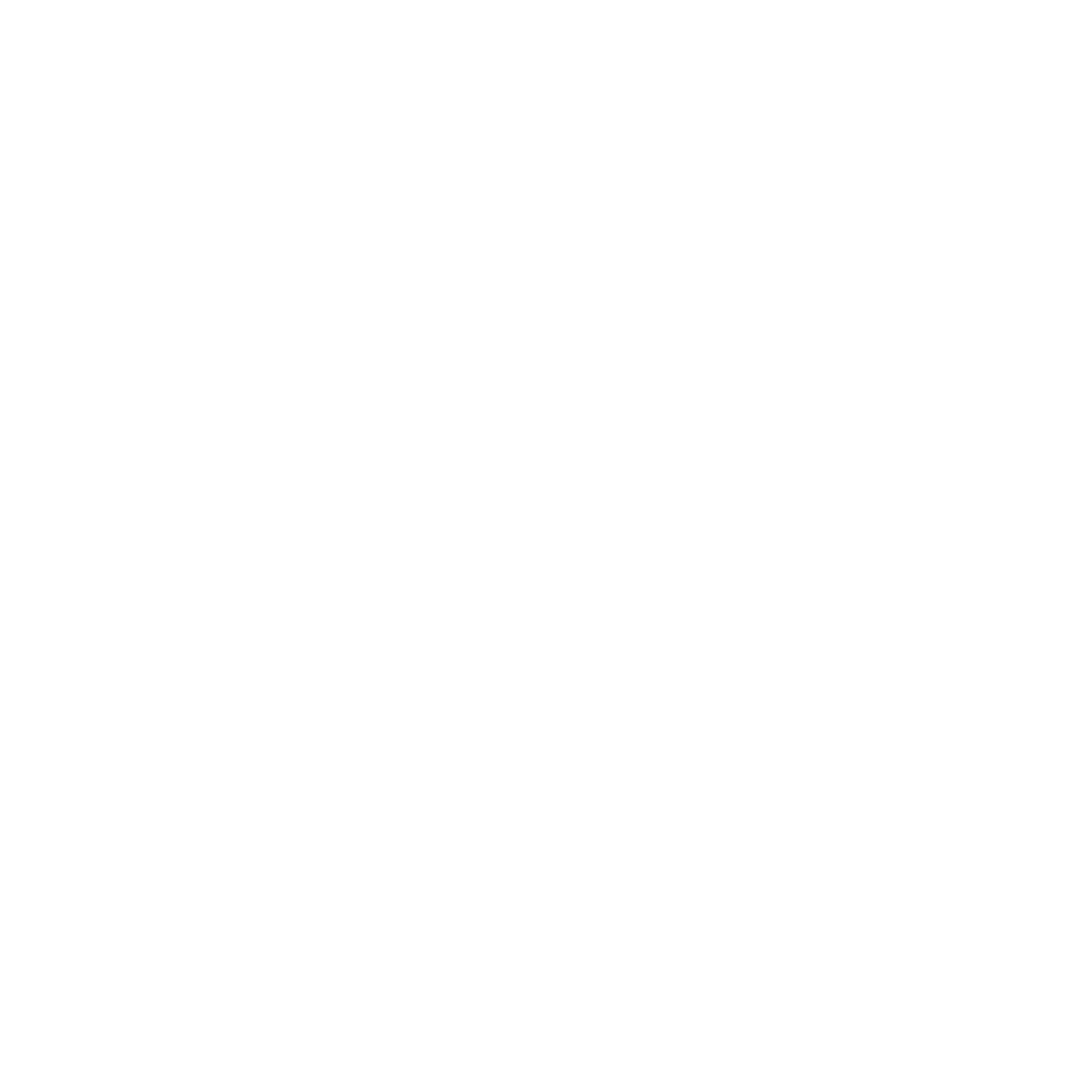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 마라도 둘레길은 마라도항에서 시작하여 국토최남단비까지 진행 방향이 서쪽이든 동쪽이든 섬을 한 바퀴 순환하는 길이다. 가파도만큼이나 낮고 평평해 느긋한 걸음으로 1시간 정도면 섬을 한 바퀴 걸을 수 있다. 사방팔방 확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광활한 들판 위를 걷는 느낌이다.
마라도에는 그 상징성 때문에 3대 종단의 신전이 다 들어서 있다. 불교의 사찰과 천주교 성당, 개신교 교회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들 종교시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정작 오랜 세월 마라도를 지켜온 토착신의 신전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토착신의 신전은 번듯한 건물 하나 없기 때문이다. 이 신전은 마라도 들머리 오른쪽 해변에 있는 애기업개 당이다. 제주는 신들의 왕국이다. 무려 1만8천의 신들이 거처한다. 마을마다 마을신들이 따로 있다. 마라도의 신은 애기업개다. 마라도에 가거든 잊지 말고 애기업개당을 찾아가시라. 거기 섬의 신화와 역사가 다 들어 있다. 애기업개는 오랜 세월 섬의 수호신이었다. 살아서 처참했으나 죽어서 신이 된 여자 아이.
옛날 가파도와 마라도에 사람이 살지 않던 시절, 모슬포 사는 이씨 여인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여인은 관에 신고했으나 부모를 찾지 못했고 아이는 여인에게 맡겨졌다. 아이가 없던 여인은 딸처럼 길렀다. 아이가 여덟 살 되던 해 여인은 아이를 낳았다. 주어다 기른 아이는 애기업개가 되었다. 애기업개는 구성진 소리를 잘도 했다. 갓난아이가 울 때면 애기업개는 아이를 업고 얼르며 자장가를 불러 주었다.
“아가 아가 우지마라. 아방 있고 어멍 있는 아가 너 왜 우느냐.”
애기업개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달랬다. 그 무렵 마라도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禁)섬이었다. 섬 주변에 해산물이 넘쳐나도 물살이 거세 좀처럼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매년 봄 망종 때부터 보름간은 물살이 없어 입도(入島)가 허가 되었다. 어느 봄 모슬포의 ‘잠수’들이 테우를 타고 마라도로 들어갔다. 테우 주인인 이씨 부부는 아이와 열 세 살이 된 애기업개를 함께 데리고 섬으로 갔다. 잠수들은 지천으로 널린 해산물을 손쉽게 건저 올렸다. 식량이 다 떨어질 즈음 잠수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테우가 섬을 벗어나려 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다. 떠날 것을 포기하고 섬으로 돌아오니 바람은 잠잠해 졌다. 다시 떠나려면 또 바람이 거세졌다. 그러기를 여러 날 반복됐다. 잡아놓은 해산물까지 다 먹고 없어졌다. 물과 양식이 아주 바닥나 버린 날 저녁 잠수들은 기어코 내일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가장 연장자인 잠수가 꿈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꿈에 애기업개를 두고 가지 않으면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고 했다. 테우의 주인 이씨 부인 또한 같은 꿈을 꾸었다. 잠수들은 애기업개를 놓고 가기로 결정했다. 이씨 부인은 기저귀 하나를 걸어놓았다. 테우에 사람들이 오르자 다시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씨 부인은 애기업개에게 기저귀를 걷어오도록 시켰다.
애기업개가 기저귀를 가지러 간 사이 테우는 떠나갔다. 애기업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테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 3년 동안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마라도에 가지 못했다. 3년 후 사람들이 다시 마라도에 들어갔을 때 애기업개는 백골이 되어 있었다. 잠수들은 뼈를 거두어 묻었다. 후일 마라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한 노인의 꿈에 자꾸 애기업개가 나타났다. 섬사람들은 애기업개가 죽은 자리에 당을 만들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애기업개당은 처녀당, 할망당이라고도 한다. 커보지도 못하고, 늙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가 처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다. 섬의 수호신으로 자라난 것이다. 애기업개당은 1995년 무렵 한차례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어떤 기독교인이 미신이라는 이유로 당을 망가뜨렸다. 제주 어느 곳처럼 마라도에도 집 근처에 무덤이 있다. 제주만이 아니다. 섬에서는 대문 밖에다 무덤을 쓰는 일도 흔 하다. 무덤은 밭 가운데도 있고 뒷마당에도 있다.
땅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섬사람들이 죽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섬사람이 본래 무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섬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일상인 까닭이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박한 것이다. 생사불이(生死不二)를 늘 목전에서 보고 사는 삶.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밭이기도 한 바다가 언제든 죽음의 수렁이 될 수도 있다. 바다가, 바람이, 풍랑이 섬사람들로 하여금 생사불이의 화두를 깨치게 한 것이다.
국토 최남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마라도는 독도와 함께 가장 유명한 한국의 섬 중 하나다. 마라도는 가파도 만큼이나 평평하다. 산은 커녕 구릉조차 없다. 마라도에는 제대로 된 숲도 없다. 인공조림으로 소나무들을 조금 심었으나 바람 때문에 성장이 더디다. 본래부터 마라도가 민둥한 땅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살기 전 마라도는 원시림으로 덮인 울창한 숲이었다.
공도와 해금령이 풀리고 마라도에 사람들이 다시 이주해 살기 시작한 것은 1883년 무렵이었다.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어떤 사람이 살길을 찾아 탄원을 한 끝에 허락을 받아냈다. 처음 섬에 들어온 도박꾼과 일행이 몇 뙈기 밭을 일구기 위해 수 천 년 원시림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마라도의 모든 것을 태우는데 석 달 열흘이 걸렸다는 전설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천년 세월이 불타는데 석 달이 길다 하겠는가.
나무를 다 없애버렸으니 섬에는 땔감이 없었다. 그래서 연료를 얻을 목적으로 소를 길렀다. 유목민들처럼 소똥을 주어다 넓적하게 빚어 돌담이나 잔디밭에 널어 말린 뒤 땔감으로 썼다. 전기가 없고 등잔 기름이 없던 시절에는 빅게(수염상어)와 도롱이(불범상어)를 잡아 내장을 끓인 뒤 기름을 만들어 불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