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도는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자 시금치 섬초, 명사십리 해변으로 유명한 섬이다. 비금도 그림산길은 비금도의 명산인 선왕산과 그림산으로 이어지는 길로, 등산로지만 험하지 않아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다. 능선길을 따라 숲과 다양한 형태의 바위가 조화를 이룬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비금도 앞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은 장관을 이룬다.

비금도(飛禽島)의 대표 명사는 ‘섬초’와 천일염, 그리고 이세돌이다. 섬초는 겨울 시금치를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이고, 호남지방의 천일염은 비금도가 그 시초다. 1980년대부터 비금도 인근 사람들은 시금치를 상업적으로 재배했는데 비금 농협에서 1996년 3월 섬초로 상표 등록을 하면서 시금치 매출이 급등했다. 브랜드의 힘이기도 하지만 찬바람을 견디고 자란 섬 시금치의 달고 고소한 맛이 도시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원인이다. 잎이 두툼한 겨울 섬의 노지에서 자란 시금치를 맛보면 내륙의 밭에서 자란 시금치는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다.
대동염전은 박삼만 등이 만든 호남 최초의 천일염전이다. 박삼만은 청년시절 강제징용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평안도의 귀성염전에 염부(鹽夫)로 차출돼 천일제염법을 배웠다.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1946년에 손봉훈 등과 함께 수림리 앞 화렴터에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천일염전 조성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 염전을 호남시조염전 혹은 1호염전이라 부른다. 이 염전을 시작으로 호남 지역의 천일염 제조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현재 신안군에서 한국 소금 생산량의 70%가 나오는 것도 모두 박삼만의 시조염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박삼만은 1947년, 수림천일염개발조합을 결성을 주도했으나 1948년경 비금도를 떠났다. 목포로 이주했다가 후일에는 영광에서 살았다. 시조염전의 성공 뒤 비금도 주민들 450세대가 대동단결해서 1948년경 염전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원들은 비금도와 분리 되어 있던 가산도와 시랑도를 간척해 그 사이에 염전을 만들었다. 그것이 당시로는 한국 최대 규모였던 대동염전이다. 소금을 만드는 염부가 150명, 보충염부가 50명이나 됐다. 대동염전은 2007년 11월 22일, 등록문화재 제362호로 등록되었다.
비금도 원평은 일제강점기부터 강달이 파시로 유명했던 포구다. 파시철이면 해변 모래 언덕에 술집이 50여개나 들어섰고 선구점과 임시 이발소와 목욕탕 등 각종 시설이 설치됐다. 포구에는 수백, 수천척의 어선들이 몰려와 성시를 이루었다. 조기 떼가 연평바다로, 민어가 덕적도 앞바다로 산란을 하러 갔던 것처럼 강달이는 비금도 앞바다로 산란을 하러 찾아들었다. 강달이는 뻘바닥에 사는 바닥 물고기다. 원평마을 앞 바다는 모래와 펄이 섞인 너른 혼합 갯벌이 있는데 이곳이 풀등이다. 이 풀등이 바로 강달이의 산란장이었다. 원평으로 어선이 몰려들었던 이유다.
파시가 열리던 어느 해 폭풍이 원평 해안에 정박해 있던 목선들을 덮쳤다. 이 폭풍으로 목선들이 모두 파손되고 말았다. 그 후 어선들이 파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아 옮겨가면서 원평파시는 사라지고 말았다.
비금도는 이웃 섬 도초도와 1996년 개통된 서남문 대교로 이어져 한 섬이나 다름없이 살아간다. 비금도는 여의도의 15배쯤 되는 44.13㎢의 땅에 4000명이 거주하는 제법 큰 섬이다. 해안선 길이도 86.4㎞나 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비금도에는 명사십리, 원평, 하누넘 해변 등 10여개의 아름다운 모래 해수욕장이 있다. 그야말로 섬은 모래 왕국이다.
비금도는 섬의 모습이 새가 날아가는 것 같다 하여 날 비(飛), 새 금(禽)자를 써서 비금도란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이름 유래를 들을 때마다 궁금해진다. 옛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주라도 있었던 것일까? 비행기도 드론도 없던 시절에 대체 어떻게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처럼 생긴 것을 알았을까? 인근 섬에 높은 산도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한자 이름의 뜻풀이만으로 섬 이름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한글 이름을 한자화 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금도는 본래 하나의 섬이 아니었다. 여러 작은 섬들이 오랜 세월 수많은 간척으로 이어져 하나가 된 것이다. 100여 년 전에는 비금도의 논과 염전의 대부분이 바다였다. 백여년 동안 간척으로 갯벌이 땅으로 바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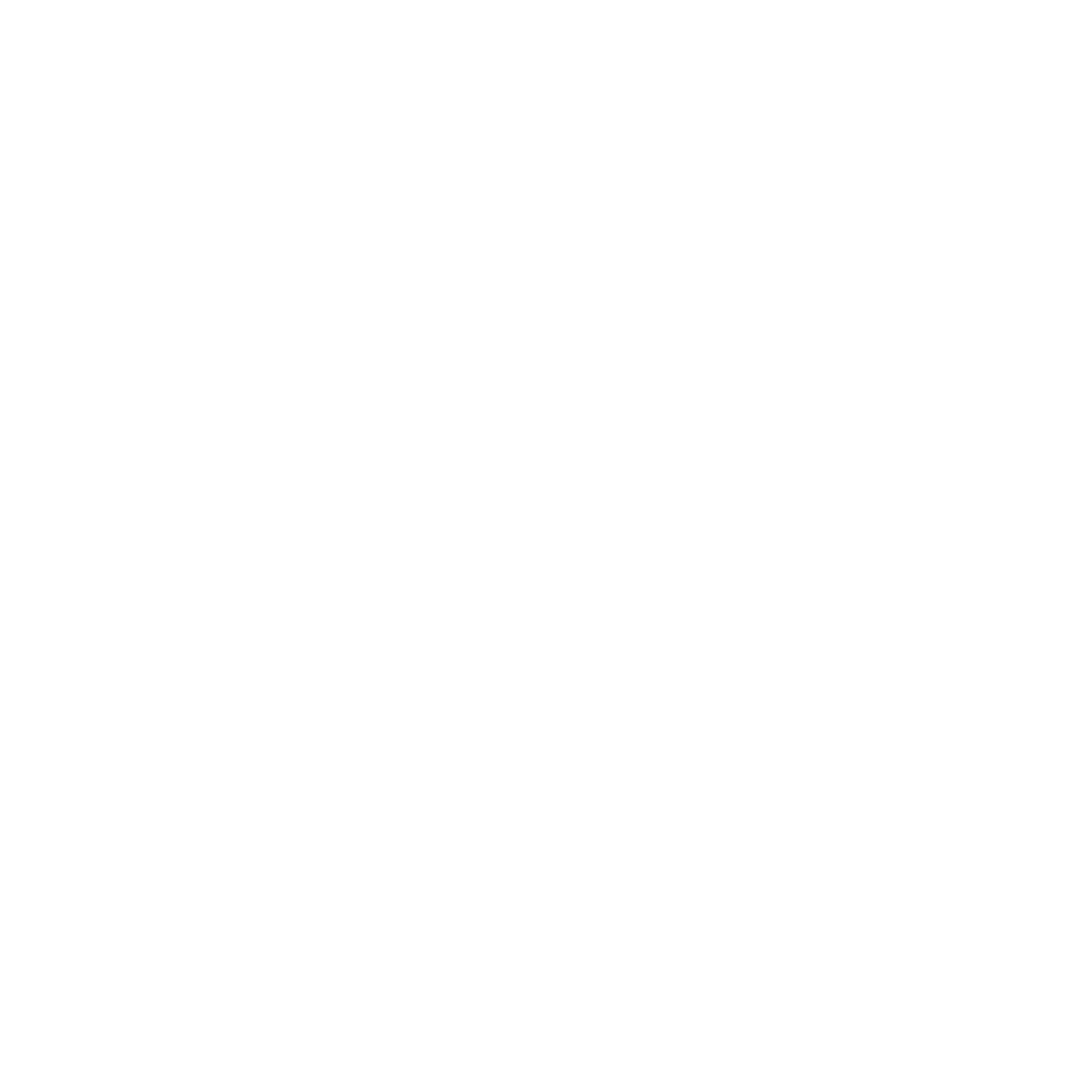
비금도는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자 시금치 섬초, 명사십리 해변으로 유명한 섬이다. 비금도 그림산길은 비금도의 명산인 선왕산과 그림산으로 이어지는 길로, 등산로지만 험하지 않아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다. 능선길을 따라 숲과 다양한 형태의 바위가 조화를 이룬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비금도 앞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은 장관을 이룬다.
비금도(飛禽島)의 대표 명사는 ‘섬초’와 천일염, 그리고 이세돌이다. 섬초는 겨울 시금치를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이고, 호남지방의 천일염은 비금도가 그 시초다. 1980년대부터 비금도 인근 사람들은 시금치를 상업적으로 재배했는데 비금 농협에서 1996년 3월 섬초로 상표 등록을 하면서 시금치 매출이 급등했다. 브랜드의 힘이기도 하지만 찬바람을 견디고 자란 섬 시금치의 달고 고소한 맛이 도시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원인이다. 잎이 두툼한 겨울 섬의 노지에서 자란 시금치를 맛보면 내륙의 밭에서 자란 시금치는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다.
대동염전은 박삼만 등이 만든 호남 최초의 천일염전이다. 박삼만은 청년시절 강제징용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평안도의 귀성염전에 염부(鹽夫)로 차출돼 천일제염법을 배웠다.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1946년에 손봉훈 등과 함께 수림리 앞 화렴터에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천일염전 조성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 염전을 호남시조염전 혹은 1호염전이라 부른다. 이 염전을 시작으로 호남 지역의 천일염 제조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현재 신안군에서 한국 소금 생산량의 70%가 나오는 것도 모두 박삼만의 시조염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박삼만은 1947년, 수림천일염개발조합을 결성을 주도했으나 1948년경 비금도를 떠났다. 목포로 이주했다가 후일에는 영광에서 살았다. 시조염전의 성공 뒤 비금도 주민들 450세대가 대동단결해서 1948년경 염전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원들은 비금도와 분리 되어 있던 가산도와 시랑도를 간척해 그 사이에 염전을 만들었다. 그것이 당시로는 한국 최대 규모였던 대동염전이다. 소금을 만드는 염부가 150명, 보충염부가 50명이나 됐다. 대동염전은 2007년 11월 22일, 등록문화재 제362호로 등록되었다.
비금도 원평은 일제강점기부터 강달이 파시로 유명했던 포구다. 파시철이면 해변 모래 언덕에 술집이 50여개나 들어섰고 선구점과 임시 이발소와 목욕탕 등 각종 시설이 설치됐다. 포구에는 수백, 수천척의 어선들이 몰려와 성시를 이루었다. 조기 떼가 연평바다로, 민어가 덕적도 앞바다로 산란을 하러 갔던 것처럼 강달이는 비금도 앞바다로 산란을 하러 찾아들었다. 강달이는 뻘바닥에 사는 바닥 물고기다. 원평마을 앞 바다는 모래와 펄이 섞인 너른 혼합 갯벌이 있는데 이곳이 풀등이다. 이 풀등이 바로 강달이의 산란장이었다. 원평으로 어선이 몰려들었던 이유다.
파시가 열리던 어느 해 폭풍이 원평 해안에 정박해 있던 목선들을 덮쳤다. 이 폭풍으로 목선들이 모두 파손되고 말았다. 그 후 어선들이 파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아 옮겨가면서 원평파시는 사라지고 말았다.
비금도는 이웃 섬 도초도와 1996년 개통된 서남문 대교로 이어져 한 섬이나 다름없이 살아간다. 비금도는 여의도의 15배쯤 되는 44.13㎢의 땅에 4000명이 거주하는 제법 큰 섬이다. 해안선 길이도 86.4㎞나 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비금도에는 명사십리, 원평, 하누넘 해변 등 10여개의 아름다운 모래 해수욕장이 있다. 그야말로 섬은 모래 왕국이다.
비금도는 섬의 모습이 새가 날아가는 것 같다 하여 날 비(飛), 새 금(禽)자를 써서 비금도란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이름 유래를 들을 때마다 궁금해진다. 옛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주라도 있었던 것일까? 비행기도 드론도 없던 시절에 대체 어떻게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처럼 생긴 것을 알았을까? 인근 섬에 높은 산도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한자 이름의 뜻풀이만으로 섬 이름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한글 이름을 한자화 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금도는 본래 하나의 섬이 아니었다. 여러 작은 섬들이 오랜 세월 수많은 간척으로 이어져 하나가 된 것이다. 100여 년 전에는 비금도의 논과 염전의 대부분이 바다였다. 백여년 동안 간척으로 갯벌이 땅으로 바뀐 것이다.